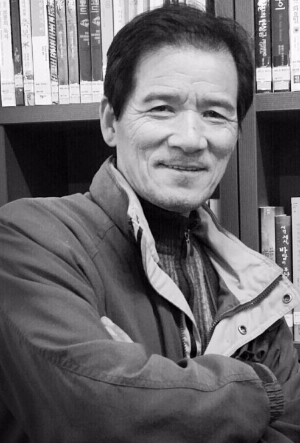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일찍이 다자이 오사무는 “여름은 샹들리에. 가을은 등롱(燈籠)”이라고 했다. 가을은 여름 속에 숨어들어 와 있는데도 사람들이 불볕더위에 속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라고. 그래서일까.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면서 이렇게 계절의 기미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여름내 재재발랐던 빛의 걸음걸이가 굼떠지기 시작하면 들판엔 가을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하고, 초록 잎 뒤에 숨어 조금씩 부풀어 오르던 열매들이 점차 붉게 익어가며 자신을 드러낸다. 벌초 가는 길에 만났던 연보랏빛 쑥부쟁이와 벌개미취, 길섶에서 하늘거리던 다양한 색깔의 코스모스들… 천변에 줄지어 선 산딸나무의 분홍색 열매라든가. 산사나무와 마가목의 열매들도 점점 붉은빛을 더하며 햇볕을 쬐고 있다.
여느 나무들보다 빨리 단풍 드는 벚나무는 벌써 물든 이파리를 서둘러 내려놓고 있다. 벚나무 밑을 지나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물든 이파리 하나 주워 책갈피에 꽂았다. 체로금풍(體露金風), 낙엽귀근(落葉歸根). 가을바람에 나무의 본체가 완연히 드러날 때까지 낙엽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힘겨운 상황에 부닥칠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듯이 봄에서 여름에 이르도록 초록 일색으로 풍성하던 잎들이 모두 지고 난 뒤에야 나무는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나무라면 잎을 다 내려놓은 뒤에도 초라해지지 않는 당당한 나무였으면 싶다.
집을 나설 때마다 내 눈길을 잡아끄는 건 담장을 넘어 온 옆집 대추나무다. 여름내 숱한 비바람에 시달리면서도 크고 실한 대추알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 가장 늦게 잎을 틔우고 보란 듯이 예쁜 꽃을 피운 적도 없지만, 여느 나무보다도 실한 열매들을 가지가 휘어지도록 가득 달고 서 있는 모습이 여간 대견한 게 아니다. 오직 튼실한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사나운 비바람과 한여름의 땡볕을 견디고 이겨낸 대추나무를 보면 사소한 일에도 마냥 흔들리던 내가 한없이 부끄러운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 흔히 가을을 두고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왜 나의 바구니는 가을이 되어도 늘 가볍고 채워지지 않는 걸까.
마음이 헛헛하다면 하늘을 보자. 헤르만 헤세는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거나 활기에 가득 찬 좋은 생각을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맑고 투명해진 가을 하늘엔 수시로 피어나는 구름도 예쁘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며 꽃향기를 따라 걷다가 가끔은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무심히 바라보자. 햇빛에 반짝이는 윤슬을 바라보며 생의 순간순간이 반짝인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이 가을이 무료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들고 있는 자신의 바구니가 가볍고 반쯤은 비어 있다고 느낀다면 헤르만 헤세의 다음 당부를 기억할 일이다. “자신의 삶에서 느꼈던 순수하고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진지해진다면 그 시간은 더 밝아지고, 미래는 더 위안이 되며, 삶은 더 사랑할 가치가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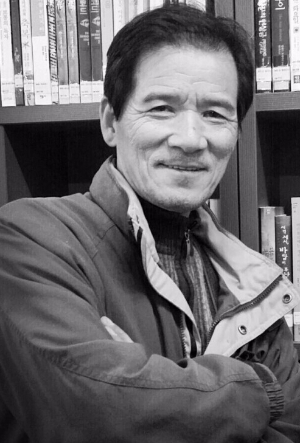
















![[뉴욕증시] 美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촉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070606473105083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