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한국 철강 산업의 초창기는 대한중기(1959년)가 가장 큰 규모였다. 이 기업은 큐폴라로와 산성전로를 연결하는 제강방식이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동국제강, 삼성제강, 서울제강 등에서 쇳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제강시설은 10t급의 소규모 큐폴라로였다.
1963년에는 시온제강과 한창신철공업이, 1964년에는 동국제강의 부산공장에 제강공장이 건설되어 전로에 의해 연산 8만t의 쇳물 생산량이 26만5000t으로 늘었다. 1971년에는 31만8000t으로 늘었다. 당시 대부분의 철강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적극화했으나 일부는 딴 짓을 해서 미래를 망쳤다.
1970년대 초반에 한국강업은 사주가 설탕 수입업에 손을 댓다가 패가망신했다. 1980년대에는 일신제강이 장영자 사채사건에 휘말려 창업주가 바뀌었다. 일신제강은 사채사건으로 부도가 났다. 결국 포철이 위탁경영을 맡아 동진제강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때부터 철강기업에 문제가 일 때마다 위탁경영은 통과의례처럼 진행됐다.
한보철강은 주인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 이 철강기업의 최초 이름은 극동철강이다. 극동철강은 1958년 이원재씨가 설립했다. 산업은행이 발표한 1962년도의 자료를 보면 극동철강은 소형압연기로 연간 9000t 규모의 철근을 생산하고 있었다.
당시 경남지방에서는 부산신철공업(7500t), 조선신철공업(4500t), 대한선재공업(6000t), 한창신철공업(4500t), 대한신철공업(4500t) 등 소규모의 압연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했던 극동철강은 1976년 금호그룹으로 매각됐다가 1980년에 한보그룹으로 넘어갔다. 한보 정태수 회장은 코렉스공법의 제철설비를 도입하려 했으나 박상고철과 같은 원료의 구매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패했다. 한보는 현대와 동국제강이 인수 경합을 벌였으나 현대그룹이 품에 안았다. 지금은 현대제철이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강 부문의 최고기업이었던 기아특수강은 1955년 김연준씨가 창업한 대한중기공업이 원조이다. 이 기업은 1990년 기아그룹으로 넘어갔다. 삼미특수강은 1966년 김두식씨가 설립했다가 2세(김현철·김현배 회장)경영을 진행했으나 캐나다 등의 해외 특수강 기업을 잘못 인수한 것과 수요 감소로 인해 그룹전의 자금난을 촉발시켜 포스코와 세아그룹에 각 공장을 매각했다. 1953년에 정인욱씨가 설립한 강원산업은 IMF 직후 사돈기업인 현대제철에 합병되었다.
철강기업의 주인이 바뀌는 이유는 설비경쟁력에 등한시하거나, 철강과 연관 없는 사업에 기업력을 분산시킨다거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그룹전체가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는 경우 발생했다. 안타까운 것은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회사의 주요 설비를 가장 잘 아는 엔지니어들이 주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이직을 해야 했다는 대목이다.
김종대 글로벌이코노믹 철강문화원장
김종대 글로벌i코드 편집위원 jdkim8710@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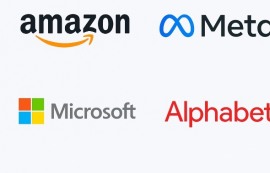


![[뉴욕증시] 1월 고용동향·CPI 발표에 '촉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0804041508428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