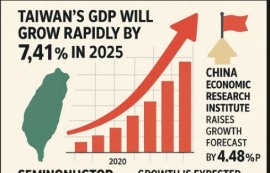금융당국·예보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TF' 최종 회의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1인당 5000만원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고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뱅크런'(온라인 뱅킹을 통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해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했지만, 현재 금융환경에선 대출금리가 오르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현행 유지 ▲단계적 상향 ▲일부 예금에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를 두고 어떤 안을 국회에 보고할지 논의가 이뤄졌다. 최종 논의 결과는 다음 달 중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현재 경제상황과 금융환경 여건을 고려했을 때 한도 상향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 금융사는 보호예금 등의 평잔에 은행은 0.08%, 증권사·보험사는 각각 0.15%, 저축은행은 0.40%의 예금보험료(예보로)를 매년 예보에 적립한다.
문제는 보호한도가 오르면 금융사가 예보에 부담해야 하는 예보료가 인상되는데, 이 비용이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오르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결국 이미 고금리로 서민층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호한도 상향이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보험한도 상향으로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추가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금융권별로 약 1~2% 안팎이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금융권은 업권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은행권은 현행 유지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에 반색하고 있다. 2금융권보다 건전성 규제가 높아 안전성이 높은 은행 입장에서 예보료 인상은 실익은 전혀 없이 비용만 높아지는 탓이다.
저축은행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4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미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득실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서다.
또 대형사와 소형사 간 상반된 경영환경도 변수다. 보호한도가 오르면 저축은행업계의 전체 수신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만 이 자금이 대형사로 향할지 소형사로 향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한도가 상향되면 소형 저축은행들은 예금자보호제도를 핑계로 예금 확보에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자금력이 큰 대형사들에게 밀려 소형사로 향하는 자금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뉴욕증시] 3대 지수↓...산타랠리 '숨고르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22705594801330be84d8767411822112019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