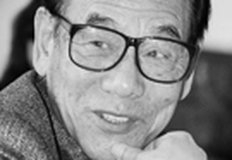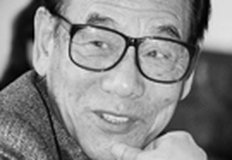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평론가는 철학적이며 미학자다운 소양을 길러야 한다. 일정한 소신과 지식을 갖추고 모든 예지와 기본적인 정보를 소지하고 조직적인 견해를 겸해야 한다. 미학은 평론에 관한 다양한 문제와 해법을 소지하고 있다.
음악은 자체가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평론은 음악에 관한 다양성을 글로 대체하기 때문에 미학은 적합한 재료이다. 미학은 사실적이며 미학적, 철학적 견해 등이 올바른가, 발표형식이 옳은가, 진보적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서구에서 호프만(Hoffmann)이 음악 비평을 중시했고, 슈만(Schumann), 바그너(Wagner)가 비상하게 격상시켰다. 시대가 변천할수록 평론가는 예술가적 본성이 있는가, 작곡가며 예술가의 소질을 겸했는지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다.
음악가는 평론가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 시인 비평가가 문예에 편견이 있듯이, 작곡가는 자기 예술과 동질성에 악평을 제기할 문제가 생긴다. 브람스(Brahms)는 바그너(Wagner)를, 슈베르트(Schubert)는 베버(Weber)를 이해하지 않은 것이 실례(實例)이다.
연주가는 기교성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당한 평론이 제한되고 있다. 가령 연주가나 작곡가가 평론가로서의 기술적 연마를 통해 평론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평론가가 음악가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평론은 예술가적 자질과 풍부한 음악성을 지녀야 하며 가능한 음악 전반에 걸친 지식 보유가 우선이다. 음악평론가는 글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관점을 주장하기 때문에, 단순히 예술적 체험만으로 평론이 해결되지 않는다.
평론가에겐 오감의 훈련이 필요하다. 주관적 체험을 넘어 내적으로 자신을 각인시키지 않고 목표가 되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아무런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대상을 평가하기란 무척 어렵다.
평론가는 자유로운 문어체로 언어 형성 능력을 배가해야 한다. 빈틈없고 정교한 표현력, 풍부한 이상과 상상력, 명철한 판단력을 겸비해야 한다. 평론가가 다양한 비평적 능력을 갖출 때, 연주가 예술가 언론인도 아닌 평론가만의 색깔을 드러낼 것이다.
예술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가의 현실적 의도가 아니라 예술 작품 속의 실현성이다. 음악가는 표현에서 자기중심적이거나 악보에 치중한다. 예술 작품 자체만이 가치가 있다.
진정한 평론가는 작품 속에서 작곡가가 의식하지 못했거나 숨긴 의도 모두를 찾아내야 하고 연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예술가가 목표 지점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묻기보다는 실제 연주 자체에서 보인 내적인 의도와 표현의 적합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평론가는 예술가의 이상적인 청자가 되고 청중의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그는 섬세한 귀를 갖고 모든 선한 것을 보고 예술가의 그릇된 악을 판별한다. 모든 분야에 모순이 있듯이 평론가에게도 모순이 있다. 작품을 감상할 때 평론하려는 몸가짐이 되어있어야 한다.
평론가는 예술계에서 중요한 존재로서 어려운 예업(藝業)을 수행하며 연주와 비평의 유연한 맥을 형성한다. 나아가 연주가가 일반 개개인의 호평을 받는다면 비로소 그 업적은 선 굵은 예술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순영 음악평론가 겸 작곡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