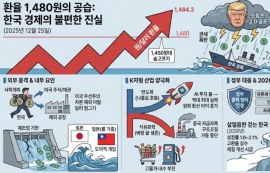영국 보안 전문가 "우크라이나 드론 모스크바 공격이 치명타"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영국 대중매체 더 선은 무인기(드론)가 모스크바를 강타하기 시작했고, 친 우크라이나 파르티잔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브루넬 대학의 보안 전문가 크리스티안 구스타프손 박사의 말을 인용해 3일(현지 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구스타프손 박사는 "겉보기에는 흔들리 않는 푸틴의 권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며 "이런 공격의 물결은 러시아 엘리트와 한때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퍼지면서 푸틴 권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공격이 크렘린에서 내분을 불러일으키고 모스크바의 엘리트 권력자들 사이에 불만을 퍼뜨리고 사람들이 푸틴의 계획에 의문을 갖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스타프손 박사는 이 전쟁 게임에서 "우크라이나가 판돈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충분한 역동성을 가진 일부 부문을 강타하고 러시아군이 항복하면서 전선 중 하나가 크게 무너지면 푸틴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스타프슨 박사는 “모스크바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크렘린 내에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푸틴의 위치에 문제를 일으키며 장비를 전장에서 끌어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가 첨단 전자전 및 방공 시스템을 러시아로 다시 이전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은 최전선에서 러시아 목표물을 더 잘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은 "푸틴의 군대가 러시아 수도에 도달하는 드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전부 망할 일을 하는 것에 매우 분노했다"고 말했다.
프리고진은 모스크바를 방어하지 못한 크렘린 군사 엘리트들에게 "냄새나는 쓰레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푸틴의 전쟁 장악력은 지난 주 반푸틴 파르티잔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 벨고로드 지역의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하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주로 자유러시아군단에 소속된 파르티잔은 탱크와 드론을 동원해 국경 마을을 공격했다. 이는 1969년 이후 러시아 영토에 대한 최초의 무장 공격이다.
구스타프손 박사는 이런 까닭으로 "전쟁이 갑자기 도시 엘리트들 사이에 불안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시닥했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과 같은 독재자도 통치를 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격은 봉기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지만 푸틴이 조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도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인 존 허버트는 "푸틴의 독재자 이미지에 균열이 가고 있다. 크지는 않지만 눈에 띄는 균열이 있다"고 말했다.
허버트 전 대사는 "러시아 영토가 공격받는 것은 푸틴의 합법성과 입지를 깎아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스크바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과 그의 영토에서 싸우는 파르티잔은 푸틴에게 당혹스러운 일이며 혼란을 증명하고 크렘린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설명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