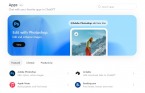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세턴홀대 교수이자 미 육군 예비역 중령인 브렌단 발레스트리에리는 13일(현지시각)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에서 국의 군 복무제도가 군과 사회의 공동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해 군이 사회와 동떨어진 기관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복무자와 비복무자 간의 간극이 확대되고, 국민들은 군 복무를 피해야 할 의무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82%가 군 복무를 피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4%는 군 복무로 인한 손실이 이익보다 크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인식은 지난 2023년 5년 이상 복무한 장교와 부사관 9481명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로 군을 떠난 것과 ROTC 지원자 감소로 이어졌다. 또 2021년에는 3123명의 공무원이 첫해에 사직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3배 증가한 수치다.
발레스트리에리는 이같은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한국의 군 복무제도가 사회적 대표성과 군과 민간 세계 간의 공유 가치를 형성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특히 ROTC 지원자 감소와 2023년 장교 및 부사관의 대규모 이탈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또 ROTC 출신 장교들의 진급 제한은 군 내부의 계층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민군 간의 분열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분석했다.
해결책으로 발레스트리에리는 싱가포르, 스위스, 핀란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잘 갖춰진 예비군 모델을 도입해 군과 사회의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의 98%가 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88%는 강제가 아니라도 가족과 지인에게 군 복무를 권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힐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한국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제도처럼 군 경험이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될 때, 복무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사회적 연대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