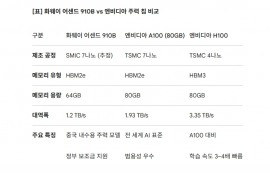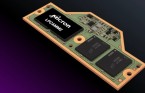“고농축 우라늄도, 기술도 멀었다”…‘파이브 아이즈’ 장벽에 막힌 대한민국 SSN의 미래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123협정 앞 고심 깊어지는 정부…“핵연료·기술 모두 ‘NO’”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또는 도입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여러 언론과의 접촉에서 “한미 123협정 개정이 한국 독자 핵잠수함 확보에 걸림돌”이라며 미국과 협상을 위한 테이블 마련 의지를 드러냈다.
한미 123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핵분열 물질을 군사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우라늄 농축도 20%를 넘기거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미국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군사용 핵잠수함 추진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확보부터 차단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123협정 일부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를 일부 허용했으나, 군사용 전환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 비확산 기구는 한국 핵잠수함 개발이 군사 전용될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파이브 아이즈’는 닫혀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우 박사는 “한국은 국민용 대형 원자력발전소 26기를 운영하며 전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는 6위 원전 보유국이다. 조선·원자력공학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운용 능력까지 확보했다. 최근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시험장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 SSN 개발 기본 조건은 충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핵잠수함 기술 공유 동맹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호주, 영국과 달리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 최근 한국 정치권에 친중(親中) 성향 논란이 있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신뢰가 줄어든 상태다.
호주 전직 외교관은 “한국 내 친중파 존재와 군사용 핵기술 전용 우려 때문에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 이전에 부정적”이라며 “호주에 SSN 기술 이전조차 큰 부담인 상황에서 한국까지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 독자 추진 움직임도 쉽지 않다
한국 정부 내 ‘자주’ 성향 인사들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으로 SSN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권에선 123협정 개정이 핵무장 전환 신속성을 뜻하는 ‘레이터시(latency)’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조 장관은 “앞으로 미국과 거래(trade-off) 방식을 모색하겠다”며 우라늄 농축·재처리를 군사 목적이 아닌 산업이나 환경 목적이라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 등은 과거 한국 핵무장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미국 현지 국방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 반대와 비확산 원칙, 동맹 간 신뢰 문제로 SSN 기술 이전과 123협정 개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본다.
한국은 세계 6위 원전 국가로 26기 원전을 운영하며 전체 전력의 3분의 1 가까이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 증대와 러시아의 우라늄 수출 제한 상황이 맞물려 농축·재처리 기술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정책 변화 없이는 제도 정비만으로 핵기술 주권 확보가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앞으로도 동맹 내 ‘파이브 아이즈’ 국가 중심으로 핵잠수함 기술 공유 범위를 한정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