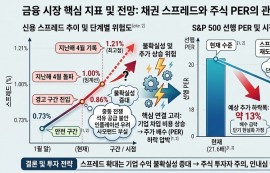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비자 만료 후 체류 초과를 막기 위해 특정 국가 방문객에게 최대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새로운 입국 규정을 시범 도입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비자 과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비즈니스(B-1) 및 관광(B-2) 비자 신청자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에서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들이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할 경우 이를 환급하는 내용의 1년짜리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증금 액수는 국무부 비자 심사관이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 “국가안보 위한 외교 정책의 핵심”…한국 등은 제외
국무부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한 공지문에서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비자 과체류와 부실한 심사 및 검증이 초래하는 명백한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밝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해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차드, 수단, 미얀마 등에서의 과체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복잡한 행정 절차 시험…“입국 자체 차단될 우려도”
국무부는 과거 보증금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었으며 발표문에서도 “보증금의 납부, 처리, 반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활용을 꺼려왔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고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대 1만5000달러라는 고액 보증금은 개발도상국 방문객에게 사실상 입국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WSJ는 “이같은 조치가 일부 국가 여행자들에게 미국 입국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