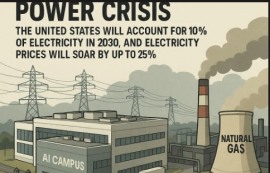2.6조 달러 RRP '완충장치' 소진…은행 지준금 의존 불가피
2019년 '레포 사태' 재연 우려…9월 법인세 납부일이 최대 고비
2019년 '레포 사태' 재연 우려…9월 법인세 납부일이 최대 고비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바닥 드러낸 RRP…2년 만에 2조6000억 달러 증발
RRP는 머니마켓펀드(MMF)나 은행 등이 초과 유동성을 연준에 단기로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창구다. 시장에 현금이 넘칠 때는 안전판 몫을, 현금이 필요할 때는 공급원 몫을 해왔다.
이용 규모가 사상 최고였던 2022년 12월, 100개가 넘는 기관이 총 2조6000억 달러(약 3598조4000억 원)를 RRP에 예치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 잔액은 288억2000만 달러(약 39조8868억 원)로 급감하며 2021년 4월 1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용 기관 수도 14개에 그쳤다. 불과 2년여 만에 시장의 거대한 여유 자금 저수지가 거의 증발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단기물 위주로 발행해 조달 금리를 낮추려는 미 재무부의 자금 조달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재무부는 정부 지출 재원을 마련하려고 7월부터 단기 국채 발행 물량을 대폭 늘렸다. 단기 국채는 RRP보다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MMF 등 주요 자금 운용 주체들을 유인했다. JP모건의 테레사 호 미국 단기 전략 책임자는 "익일물 RRP의 최대 이용자인 MMF가 7월 순발행된 단기 국채 2120억 달러(약 293조3656억 원)중 약 66%를 매입했다"고 분석했다.
8월 첫째 주 재무부는 4주물과 6주물 국채를 각각 사상 최대인 1000억 달러(약 138조3800억 원), 850억 달러(약 117조623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씨티 전략가들은 이달 말이면 RRP 잔액이 거의 '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RRP 고갈 다음은 은행 지준금…'2019년 악몽' 재연되나
RRP라는 완충 지대가 사라지면서 시장의 다음 자금 공급원은 연준에 예치된 3조3200억 달러(약 4594조8800억 원) 규모의 은행 지급준비금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시장이 지준금의 급격한 감소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레포 시장 붕괴 사태 때 지준금이 부족해지자 담보부 익일물 융자 금리(SOFR)가 급등하며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 연준이 개입해야 했다.
'충분한' 지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2조7000억 달러(약 3736조8000억 원) 수준을 가능성으로 언급했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정확한 추정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씨티는 연말 은행 지준금이 2조8000억 달러(약 3875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웰스파고의 앤젤로 마놀라토스 거시 전략가는 "앞으로 6주가 달러 레포 시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며 9월에 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9월 중순 법인세 납부일까지 2600억 달러(약 359조8400억 원)가 넘는 순 단기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이메일에서 밝혔다. 기업의 세금 납부는 시중 유동성을 재무부로 이동시켜 자금 시장의 위축을 부추긴다.
◇ 자금 경색 현실화되면…연준·재무부 대응 카드는
시장은 앞으로 두 가지 갈래를 두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긍정적인 전망은 MMF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져 추가 발행 물량을 소화하고, 자금 시장 변동성이 다소 커지더라도 연준의 개입 없이 안정을 찾는 것이다.
반면 9월에서 10월 사이 RRP 잔액이 0에 도달하고 은행 지준금이 2조7000억 달러(약 3737조3400억 원) 밑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위험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레포 금리가 급등하는 단기 자금 경색이 발생하며 재무부의 조달 비용 역시 폭등할 수 있다.
만약 위험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정책 당국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명확하다. 연준은 레포 기구를 확대하거나 단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재무부는 단기 국채 발행을 줄이는 대신 중장기 국채로 조달 비중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시장 곳곳 경고 신호…"지속적인 금리 급등이 진짜 문제"
이미 자금 시장은 분기 말 등 특정일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씨티의 알레한드라 바스케스 플라타 선임 연구원은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일회성 압박은 자금 시장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 신호와 같다"면서도 "익일물 금리의 지속적인 급등만이 실질적인 문제 신호"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 상승세가 장기화하는 현상을 두고 은행 지준금이 부족하다는 신호이자, 재무부가 단기 국채 발행 전략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유동성 감소는 국채 매수 기반을 약화시켜 재무부가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게 만들고, 국가 부채 이자 부담 증가를 부를 수 있다. 그는 "최근 1년 만기 단기 국채 입찰에서 수요 부진이 나타난 것은 유동성 감소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아직 비관하기는 이르다는 생각도 있다. JP모건의 테레사 호 책임자는 MMF가 운용 자산을 계속 늘려 단기 국채를 매입할 여력이 있어 "급작스러운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팀에 따르면, 올해 3분기(8월 7일까지) 단기 국채 ETF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에 가까운 61억 4000만 달러(약 8조4977억 원)가 순유입되며 견조한 수요를 보였다.
하지만 도이체방크의 스티븐 젱 전략가는 자금 시장의 문제가 주식 및 회사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거래되는 등 시장이 이미 긴장한 만큼, 자금 시장의 작은 균열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단기 국채 시장 이슈를 넘어 미국 금융시스템 유동성 안정성 전반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뉴욕증시] 부진한 美 경제지표에 혼조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21706464409815c35228d2f51751931501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