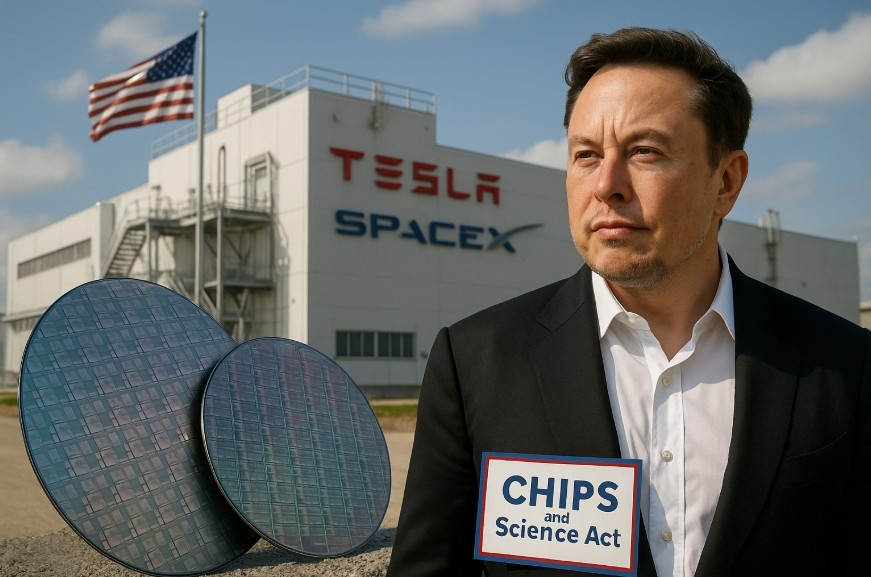TSMC와 공급 협상 무산…"외부 의존도 끊겠다"
인텔과 '도조 칩' 협력…美 본토 공급망 구축 '신호탄'
인텔과 '도조 칩' 협력…美 본토 공급망 구축 '신호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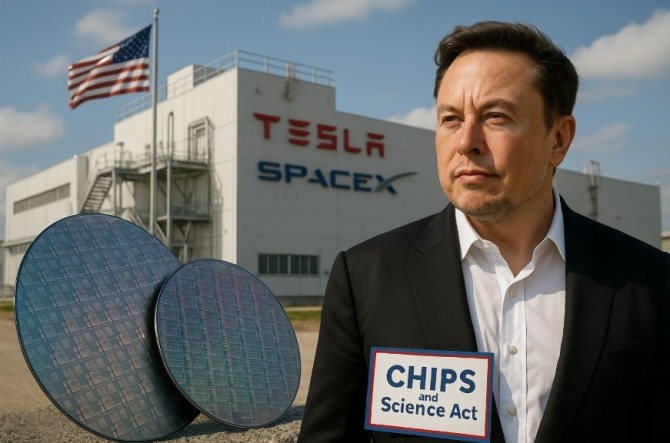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머스크의 이 같은 행보는 세계 1위 파운드리인 대만 TSMC에서 '우선 생산용량(priority capacity)' 확보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무산된 데 따른 전략 전환이다. 공급 위험을 줄이고 핵심 부품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스크는 '도조3' 칩 생산을 TSMC(주로 5~7나노 공정)와 삼성전자로 이원화하고, 패키징은 인텔 애리조나 공장에 맡겼다. 나아가 인텔과의 추가 협력과 공동 제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탈(脫)TSMC'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 불안정과 중국-대만 간 지정학적 긴장에 대비해 외부 파운드리 의존도를 줄이는 '인하우스(In-house)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셈이다.
머스크의 반도체 야망은 전 세계 공급난 속에서 미국 제조업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 발효 이후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복귀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흐름과도 일치하는 행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인텔·삼성·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자국 내 설비투자를 독려하며 전방위 확장을 촉진하고 있다. TSMC와의 공급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머스크는 외부 의존도를 끊기 위한 자체 생산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PCB 공장 이어 FOPLP 패키징까지…'수직 계열화' 박차
머스크는 반도체 수직 계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텍사스에는 FOPLP 패키징 공장 외에도 최근 인쇄회로기판(PCB) 공장이 완공돼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위성 및 전장 부품용 고밀도 회로기판을 생산하며, 스페이스X가 FOPLP 공장 운영을 총괄하며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부품 생산을 내재화하는 것이 목표다. 'PCB-패키징-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패키징 기술을 직접 확보함으로써 위성용 칩 성능을 극대화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텍사스 FOPLP 공장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이노룩스에서 위성용 무선 주파수(RF) 칩과 전력관리 반도체를 (단기 조달용으로) 공급받는다. 패키징 라인 장비는 2025년 9월부터 반입이 시작됐으며, 2026년 초 설치와 시운전을 거쳐 2026년 3분기부터 제한적 생산에 들어간다. 전면적인 양산은 2027년 1분기로 예상되며, 초기 월 생산량은 약 2000장 수준이다. 본격 양산에 돌입하면 ST마이크로와 이노룩스에서 받는 외부 조달 물량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머스크의 구상은 패키징을 넘어 웨이퍼 생산(팹)으로까지 확장된다. 그는 최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월 10만 장 규모로 시작해 최대 100만 장까지 생산 능력을 갖춘 대규모 웨이퍼 팹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폭증하는 테슬라의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용 칩 수요(즉 '도조' 칩의 자급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인 인텔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인텔과의 파트너십은 안정적인 양산 노하우에 필수적인 인력, 공정 기술, 장비망을 공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업계는 풀이한다.
젠슨 황 "TSMC 대체 어려워"…업계 "머스크 추진력 무시 못해"
머스크는 "온통 칩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반도체 공급난을 심각한 병목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급업체가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 직접 칩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PCB와 FOPLP 시설 구축이 우주 탐사, 전기차 등 그의 거대한 기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테슬라는 AI와 자율주행용 칩 생산 독립을,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용 위성 반도체 자재 자립을 뜻한다. 특히 대만 의존도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과 제한된 협상력을 벗어나기 위해 팹 확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첨단 칩 제조는 극도로 복잡해 머스크 같은 인물이라도 TSMC의 역할을 대체하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업계는 "머스크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는 FOPLP 공장 개발을 위해 TSMC·인텔·삼성과 OSAT(반도체 후공정 외주) 업체에서 핵심 인재들을 대거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미국판 TSMC 구축'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업계는 이번 사업이 초기 비용 부담은 클지라도 자율주행과 위성 통신의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나아가 머스크의 구상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민영 복귀 모델'로 업계는 분석한다. 즉 머스크는 국가 제조 목표와 자신의 사업 확장을 결합해 반도체 단계에서부터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