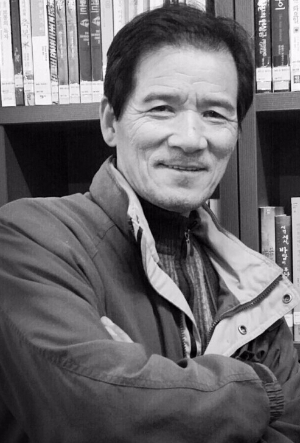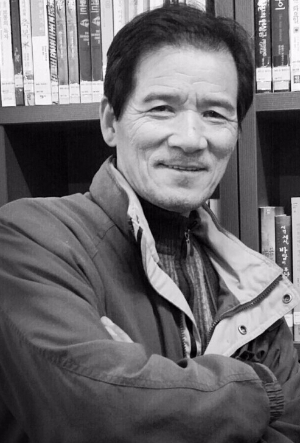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 종식으로 마스크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기엔 숲만큼 좋은 장소도 없다. 초록 잎을 가득 달고 서 있는 쭉쭉 뻗은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청량감을 주고, 그 나무들이 뿜어내는 맑은 공기가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까지도 정화한다. 숲에서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숨을 들이켜면 폐부 깊숙이 스며든 초록 향기가 온몸의 세포를 일깨우는 듯 감각의 촉수가 한껏 예민해져서 주변의 사물들이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놀람과 경이감이 없으면 삶의 지혜와 슬기도 싹트지 않는 법이다. 늘 보던 숲속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새롭게 보이고, 잎새 사이로 잘게 부서지는 은빛 햇살과 바람의 속삭임이 문득 경이롭게 느껴질 때 나는 온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오뉴월 더위에는 염소 뿔도 물러 빠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유월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달이다. 희망과 환희로 벅차서 분주하던 봄날의 흥분이 차츰 가라앉고,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느슨해질 무렵 다시 마음을 다잡아 새로운 다짐을 펼쳐 놓는 계절이다. 초록으로 물든 유월의 숲에도 꽃은 핀다. 길섶에 핀 분홍 싸리꽃에 뒤영벌 한 마리가 매달려 꿀을 빤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오래전 고향을 그리며 썼던 내 졸시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아기 노루 졸다 간/ 옹달샘 가에/ 싸리꽃 향기로워 벌떼 잦은 곳” 입속에 넣고 가만히 읊조리다 보면 고향 산천의 풍경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초록의 숲에 들어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거닐며 간간이 눈에 띄는 꽃들에게 환호하다 보면 삶의 고민쯤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마음은 초록으로 가득한 유월의 숲처럼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느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저항이 고통”이라고 했던 20세기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인도의 사상가 크리슈나무르티의 말처럼 오감을 활짝 열어 놓고 유월의 숲길을 걷다 보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파스칼도 말하지 않았던가.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 있다”라고. 숲이라는 자연 속의 ‘고요한 방’에 들어 잠시라도 쉴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화려한 꽃의 붉음을 지우고 초록으로 무성해진 잎들도 가을이 오면 결실을 위해 기꺼이 허공으로 몸을 던진다. 자연의 문법을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착한 나무들이 들어찬 숲을 보고 있으면 헝클어진 머릿속의 생각들이 가지런해지고 나도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그들 곁에 서 있고 싶어진다. 숲을 돌아 나오는데 향긋한 향기가 코끝을 스친다. 쥐똥나무 꽃향기다. 초록 이파리 사이로 자잘한 꽃을 내어 달고 짙은 향기를 흘리는 쥐똥나무 꽃을 보면 세상에 향기 한 줌 나눈 적 없는 내 삶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어여쁜 꽃도, 초록으로 무성한 잎사귀도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그 어느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는다. 뜨거운 햇살 아래 탱글탱글 단단해지는 열매들을 보라. 제아무리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한들 걱정할 것 없다. 우리 가까이엔 초록 숲이 있지 않은가.
백승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