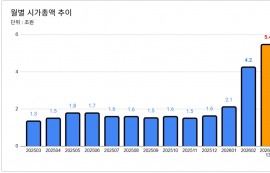캠프데이비드 회담 성공한 바이든 대통령에 쏟아지는 찬사는 한국에 '경고음'
외교가에는 흔히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얘기가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우방국 간 정상회담이 그렇다. 각급 레벨의 실무진이 머리를 맞대고 사전에 치밀하게 각본을 짜놓기에 정상회담이 ‘요식 행위’ ‘사진 촬영’ 이벤트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참모진은 정상 간 합의가 어렵거나 자국민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아예 이를 의제에서 빼버린다.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화려한 외교 이벤트의 정수를 유감 없이 보여주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백악관이 아니라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난 것부터 ‘연출’이다. 개인 간에도 친밀도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가 사적인 공간에서의 만남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 별장으로 다른 나라 정상을 초대하는 데는 그만큼 특별 대우를 한다는 메시지를 내외에 전파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세 정상은 이번에 단순히 이런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외교·안보·경제 분야 등에 걸쳐 ‘3각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 정상은 군사·안보 측면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3국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공급망 3각 연대'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중국을 배제한 ‘프렌드 쇼어링’ 공급망을 결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미국 조야(朝野)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찬사가 쏟아져 나온다. 미국 정치권이 ‘너 죽고 나 살자’식의 무한 대결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측의 주요 인사 중 누구도 이번 회의 결과에 토를 달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런 칭송은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챙겼다는 얘기다. 이는 곧 한국이 앞으로 이번 합의를 이행하면서 외교적·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무엇보다 ‘중국 때리기’에 일본을 넘어 한국까지 참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았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비롯해 3국의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 완성과 중국의 노골적인 팽창주의로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래도 남북 분단의 현실과 과거사를 묵살하는 일본의 태도,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중국의 위상은 절대 바뀌지 않았다. 미국이 일본에는 핵물질 재처리 시설을 허용하면서도 한국에는 이를 불허하는 동맹국 차별도 달라진 게 없다. 지금 워싱턴에서 울려퍼지는 축포 소리는 윤 대통령 정부가 이제부터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