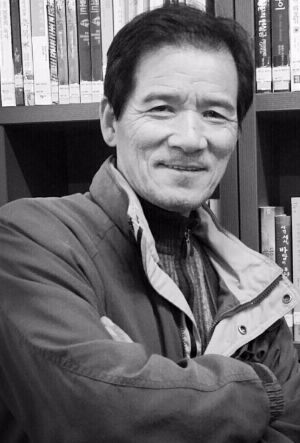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찬비 내리고 화려한 색의 향연이 끝난 거리는 관객이 떠난 야외공연장 모습처럼 한껏 어수선하다. 쓰레기를 치우듯 미화원들이 부지런히 낙엽을 쓸고, 도로변엔 낙엽을 담아 놓은 자루들이 즐비하다. 숲에 지는 낙엽과 달리 도심의 낙엽들은 바닥으로 내려앉는 순간 숱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으스러져 미화원들을 힘들게 하는 한낱 쓰레기로 전락해 버린다. 허공에 매달려 있는 동안 환호하던 사람들도 표정 없는 얼굴을 하고 무심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낙엽을 밟고 지나간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유독 가을의 끝자락은 낙엽으로 인해 여느 계절과 달리 마무리가 쉽지 않다.
비단 낙엽 때문만은 아니다. 옷깃을 헤집는 한기 품은 서늘한 바람, 가지 끝에 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몇 장 남지 않은 이파리와 석양에 빨갛게 달아올라 눈을 찔러오는 놀빛 닮은 홍시 등도 자꾸 감정의 누선을 자극해 가을과의 이별을 방해한다. 잘 이별하기 위해선 충분한 애도가 필요하다. 가만히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건강하게 마음껏 슬퍼해야 한다. 그래야 다가오는 겨울도 잘 맞이할 수 있다. 어찌하여 가을이 가는 게 아쉽고 슬픈 것인지 돌아보고 그 감정들을 몽땅 밖으로 쏟아내면 한결 개운해진 마음으로 가을과 잘 이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계절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봄이 가면 여름 오고, 가을 가면 어김없이 겨울이 그 뒤를 따른다.
어느 숲 철학자가 말하길 “길을 잃은 자여, 숲으로 가라!”고 했다. 숲에 가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그 말에 쉽게 수긍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푸른 숲으로 보일 뿐이지만 숲에 들면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사람의 비의가 숨겨져 있다는 걸 절로 알게 된다. 그저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나목으로 겨울을 나는 나무들이 사는 곳이 숲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물론 대부분의 초목이 그리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나무와 풀이 꼭 그리 살지는 않는다. 어느 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 어떤 풀은 가을에 싹을 틔우기도 한다. 또한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들쭉날쭉 한결같지 않다. 살아 청청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나무도 있다. 숲을 찬찬히 살펴보고 생각을 궁굴리다 보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찬비 그치고 나면 남은 잎들도 모두 지고 가을 산도 점점 적막에 사로잡혀 겨울빛에 잠길 것이다. 11월로 접어들면 누구나 마음에 조급증이 인다. 돌아보면 이룬 것은 별로 없는데 한 해가 후딱 지나간 것만 같아 가슴이 휑해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아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이미 지나버린 시간에 미련을 갖기보다는 남은 날들을 알차게 보낼 생각을 해야 한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찬찬히 자신을 돌아볼 일이다. 반칠환 시인은 ‘새해 첫 기적’이란 시에서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고 했다.
자신만의 속도와 보폭으로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순환하는 계절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어 있듯이 모든 생명에게 생로병사는 숙명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지금의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 일이다. 가을과 잘 이별하는 법은 생각이 아닌 오감을 동원해 이 계절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이 아닐까 싶다.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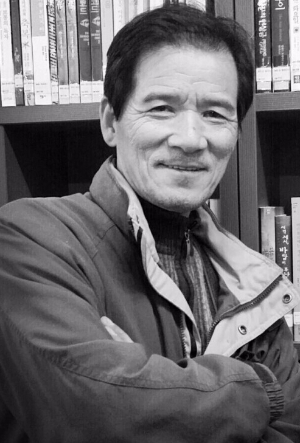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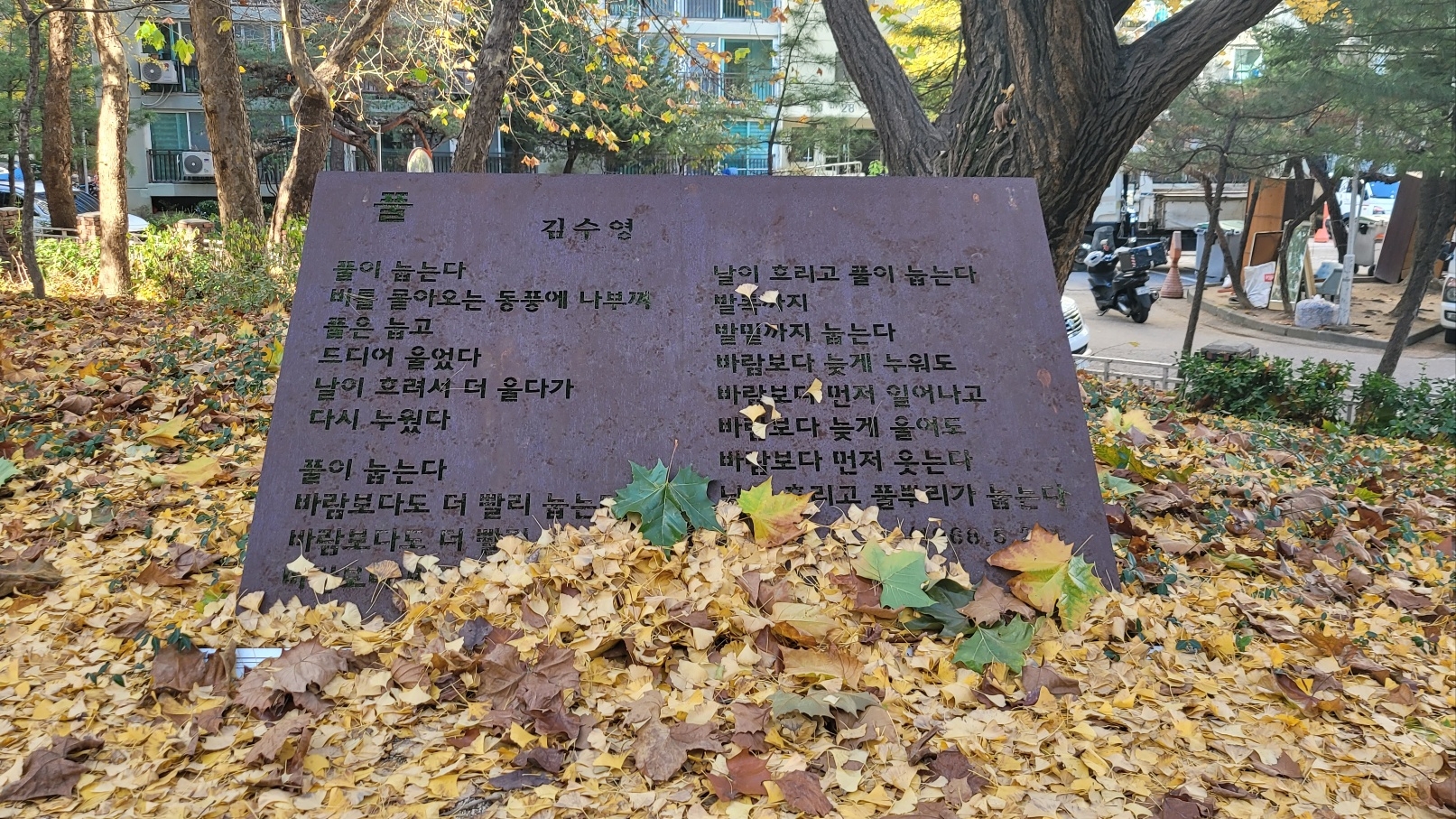
















![[특징주] 삼성전자, TSMC 역대 최대 실적 발표에 강세...52주 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1161005380722544093b5d4e211173710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