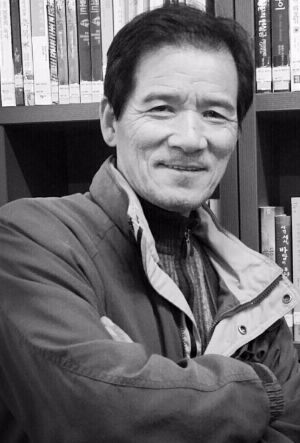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아침 일찍 간단히 배낭을 꾸려 산을 향했다. 겨울 산행에서 만날 수 있는 진귀한 풍경 중 으뜸은 눈꽃과 상고대다. 상고대는 습도와 기온, 바람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다. 비나 눈이 온 다음 날 밤새 기온이 급강하하면 공기 중의 수분이 얼면서 나무에 달라붙어 서리꽃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상고대를 보려고 일부러 멀리 높은 산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지난겨울 북한산에서 상고대를 본 기억이 있기에 내심 상고대를 볼 수 있으리란 기대에 부풀어서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상고대는 눈이 쌓여 생기는 눈꽃과 달리 공기 중의 수증기가 나뭇가지에 얼어붙어 피어나는 서리꽃이다. 상고대는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가면 곧 사라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해야만 정상 부근에서 최고의 절경을 만날 수 있다.
우이 전철역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도선사 입구를 지나 하루재를 향했다. 지난겨울엔 이 길 어디쯤에선가 오색딱따구리를 만났었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고 나무를 쪼아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눈 밟히는 소리만이 뒤를 따른다. 뺨을 스치는 새벽바람이 제법 맵차다. 하루재를 올라서니 은산철벽의 인수봉이 바짝 다가서며 나를 반긴다. 쉼터에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인 뒤 길을 재촉했다. 익숙한 길도 눈이 쌓이면 낯선 길이 된다. 하여 눈길 위에선 누구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용암문에 다다르니 눈길 닿는 곳마다 눈꽃과 상고대가 피어나 눈이 부시다. 정상에 가까울수록 바람에 날린 눈가루가 상고대에 달라붙어 점점 두꺼워진 상고대는 천상의 사슴뿔처럼 환상적이기까지 하다.
바위종다리와 일별하고 백운대 정상에 올랐다. 흰 눈에 덮여 굽이치는 산맥과 산골짜기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오르지 않고는 결코 볼 수 없는 풍광이다. 풍경에 취하다 보니 어느새 산을 오르느라 지친 몸에 생기가 돌고 맑은 기운이 차오르는 기분이다. 산을 내려가면 나는 습관처럼 봄을 기다릴 게 분명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보았던 풍경들은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있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보다는 낯설고 생경한 것의 채집이 기억이기 때문이다.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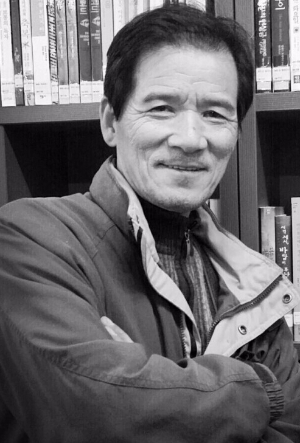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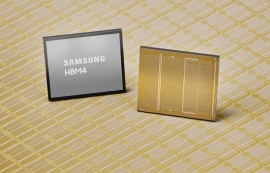








![[르포] 갤럭시 S26 시리즈 실물 공개 첫날..차분한 분위기 속 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16590706624ea14faf6f51232162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