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SAS가 IDC에 의뢰해 수행한 '데이터 및 AI 영향력 보고서: 신뢰가 이끄는 AI 시대'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AI 도입 수준은 높지만 신기술 확장과 윤리적 신뢰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은 글로벌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조사는 전 세계 IT 전문가·비즈니스 리더 23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AI의 신뢰성과 비즈니스 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도입 현황과 성숙도를 비교했다.
그러나 머신러닝 등 기존 AI 기술 도입률은 95.5%로 글로벌 평균(65.8%)을 크게 웃돌았다.
IDC가 평가한 '신뢰할 수 있는 AI 지수'(Trustworthy AI Index)에서 한국 조직 26%는 최고 등급인 '고급 수준'에 도달했지만, 30%는 가장 낮은 등급인 '기초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한국이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확산 투자 계획에서도 글로벌 대비 큰 격차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분야에 '대폭 투자 확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로 집계돼 아태지역 평균(20%)·글로벌 평균(52%)과 격차를 보였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준비도와 머신러닝 활용 역량을 갖췄지만, 신뢰 가능한 AI 거버넌스 구축이나 신기술 투자는 보수적인 편이라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토터스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AI Index' 순위(2024년)에서도 한국은 6위에 그쳤다. 'AI 2강'인 미국·중국과의 격차는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터스 인텔리전스는 “미국은 AI 과학자, 엔지니어 및 연구원을 포함해 대다수의 AI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글로벌 자석”이라고 평가했다. 인재 유출로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분야다.
다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데이터 기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장기적 시각의 AI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있는 가운데 정부의 빠른 정책 전환과 탄탄한 ICT 기반을 앞세워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많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AI 국가전략 새판'과 정부가 추진 중인 'AI 공공 데이터 센터'와 '전국 AI 랜드마크' 구축 구상이 얼마나 많은 효율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본적으로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연산 자원을 자국 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언어·문화·법적 규제까지 고려한 '자국형 AI 생태계'를 의미하는 ‘소버린 AI’를 한국이 올해 국가전략으로 격상하면서 민간과 정부의 시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세계 AI 3강’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인재 유치와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 조성과 규제 혁신이 뒤따른다면 충분히 가능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뛰어난 인프라가 AI 생태계 조성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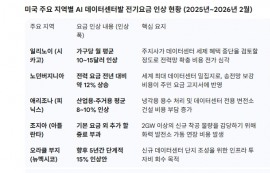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으로 혼조세 마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2703563309056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