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우위 앞세워 전처리 78%·블랙매스 정제 89%…폐배터리 핵심 광물 '블랙홀'
거대 시장·정부 지원 업고 '질주'…과잉 투자·수익성 악화는 '넘어야 할 산'
거대 시장·정부 지원 업고 '질주'…과잉 투자·수익성 악화는 '넘어야 할 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시장분석기관 로모션(Rho Motion)은 25일(현지 시각) 중국이 2023년에 이미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능력의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포함한 배터리 시장에서는 중국의 CATL과 BYD가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고,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어섰다.
◇ 압도적 생산력, 재활용 시장 지배로 이어지나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도 중국의 독주는 이미 예상된 일이다. 로모션은 보고서를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와 재활용은 밀접히 연관된다"면서 "재활용할 중고 배터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대규모 재활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시장을 장악한 주요 요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압도적 규모와 처리 능력이다. 중국은 세계 블랙매스(배터리 분쇄 후 남는 금속 함유 중간재) 생산과 소비 능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로모션은 2025년 중국이 세계 배터리 전처리 용량의 78%(360만 미터톤), 블랙매스 정제 용량의 89%(250만 미터톤)를 담당하리라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해마다 수백만 톤의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 규모·기술·정책 삼박자…中 재활용 시장 급성장 동력
둘째, 기술 우위다. 중국의 재활용 업체들은 수율 높은 수화학 공정과 열화학 공정 기술을 활발히 사용한다. 특히 배터리 분해 자동화 같은 혁신 기술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한껏 높인다.
셋째, 잘 갖춘 통합 기반시설(인프라)이다. 중국 전역에는 1200개가 넘는 수거 거점과 150개 이상의 대형 처리 공장이 가동 중이다. 이러한 전국망은 물류 비용을 줄이고 배터리 제조사와의 긴밀한 순환(폐쇄형)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넷째,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규제 지원이다. 중국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블랙매스 생산과 수입을 규제하는 새 국가표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품질 관리와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시장 지배력을 한층 다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섯째, 비용 경쟁력이다. 대규모 생산과 통합 운영 덕분에 중국의 재활용 비용은 다른 나라 경쟁사보다 30~40% 저렴하다고 평가된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자원 내재화' 가속…글로벌 전기차 공급망 '흔들'
중국의 이러한 지배력은 거대한 전기차 시장과 바로 연결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스레 막대한 양의 폐배터리가 공급된다. 로모션은 중국의 세계 배터리 제조 점유율이 2023년 80% 수준에서 2025년에는 약 85%로 더 늘어나리라 전망했다.
중국의 배터리 재활용 시장 지배는 전략상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닌다.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구리 같은 핵심 자원을 효율 높게 회수해 원자재 국외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자국 전기차(EV) 산업을 안정되게 뒷받침하고, 재활용 소재를 원활히 공급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친환경 전환과 배터리 순환 경제에서 중국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리튬·망간·코발트·니켈·구리 같은 핵심 광물이 많이 들어있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폐배터리는 먼저 기계로 분해하고 파쇄해 '블랙매스'라는 분말 형태로 만든 다음, 이 블랙매스를 정제해 전구체 활물질(pCAM)이나 양극 활물질(CAM)을 생산, 새 배터리 제조에 다시 투입해 자원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다.
로모션은 2025년 중국에서만 360만 미터톤의 폐배터리가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다른 지역(36만1000톤), 유럽(41만6000톤), 북미(19만6000톤) 등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묻지마 투자' 후유증?…지속가능 성장은 여전한 과제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이처럼 굳건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 우선, 과잉 설비 문제다. 일부 시설은 폐기물 부족과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진 지나친 설비 확충 탓에 가동률이 20~30%에 머무는 곳도 있다고 한다.
또한, 배터리 화학 조성 변화도 중요한 변수다. 최근 사용량이 늘고 있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같이 상대적으로 값싼 금속이 든 배터리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활용 사업 이익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사업 전략 수정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배터리 생산뿐 아니라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재활용을 통한 핵심 광물 회수에서도 주도권을 다잡아 세계 공급망에서 우위를 확고히 할 전망이다. 안정된 공급망 확보는 중국이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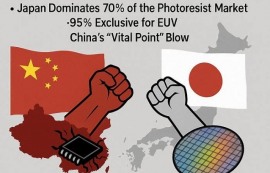




![[뉴욕증시] 4분기 실적·12월 CPI 발표 '촉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11106515507104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