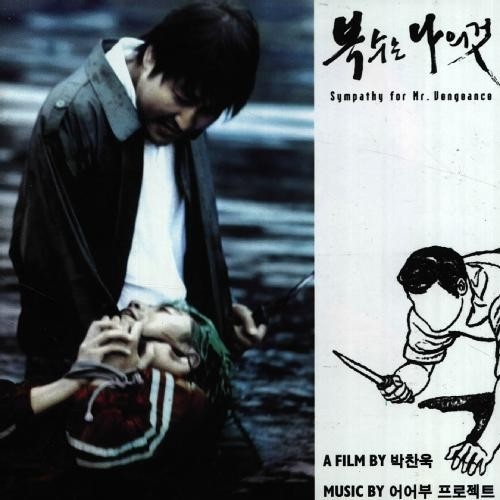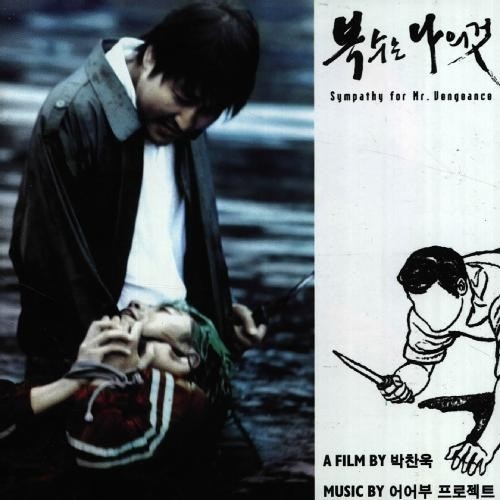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잘못하면 범죄자가 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마음속에 자라난 증오심은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복수한 후에 또다른 복수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복수당한 사람의 안 좋은 모양새는 괜한 가책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잠시다. 소위 열 받게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복수를 다짐하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술도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다시 복수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가슴 떨리는 기쁨을 맞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영화예술이 작은 기폭제라도 되어야 한다고 김흥도 감독은 강조한다.
복수에 대한 용서는 원천적으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상대방의 행동을 나의 잘못이라고 모든 걸 내탓으로 돌림으로써 시작된다. 설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한번 더 의지를 갖고 내탓이라고 생각하여보자.
사랑으로 가득찬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당신의 잘못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복수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후회가 될 것이다.
사랑과 용서는 나의 힘이 되고 후대에서는 더욱 좋을 것이다. 김흥도 감독은 자신의 영화소재를 말하여주는데 기자도 공감하는 대목이 있다. 그의 말 중 기억나는 부분이다. 나 자신만의 기억을 연결시킨 것을 인생영화라고 본다면 내기억 속 등장인물들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 가족, 일가친척, 그리고 그동안 만난 사람들일 것이다.
내 기억이라는 영화속에 나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남의 표정을 먼저 살폈고 남의 말에 귀 기울였던 기억만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너무나 이상하게도 아름답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우선 생각난다. 그리고 아주 슬펐던 기억, 지독히 사랑했던 기억들, 아주 가끔 화 났던 기억도 있다.
하지만 복수한 기억은 아주 적다. 그나마 용서에 묻혀서 더욱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리 기억해 내려 해도 나는 없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