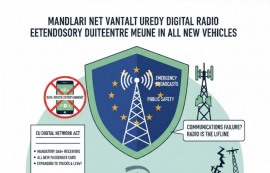기업들 "완전한 탈중국은 불가능"...대체 공급망 구축 등 대안 모색
전문가 "중국 제품 70% 의존 품목 1580억 달러 규모...단기 대체 어려워"
전문가 "중국 제품 70% 의존 품목 1580억 달러 규모...단기 대체 어려워"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이 기업 마진을 압박하고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우회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이 세 자릿수에 도달하면서 밀수나 위장 수출과 같은 위험한 선택을 고려하는 동기도 커지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전자제품 공장을 운영하는 수가인터내셔널(Suga International)의 알프레드 응 대표는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다. 현재의 관세 협정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라고 말했다. 그의 사업은 약 40%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응과 같은 제조업체들은 90일간 유예된 관세가 영구적이 될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더 높아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투자나 공장 이전을 서두르지 않고 관망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를 설정하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상황이 불투명할 때 신중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우리는 특히 미국 수입업체들이 '중국만'에서 '중국 플러스 원' 또는 '중국 플러스 다수'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고 있다. 생산은 베트남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 브라질로 이전될 것"이라고 치엔은 전망했다.
2018년 트럼프 첫 임기 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은 특정 부문에서 꾸준히 감소한 반면, 베트남·멕시코·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했다.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1.6%에서 2024년 13.3%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2017년 465억 달러에서 2024년 1366억 달러로 약 194% 증가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36%(약 1580억 달러 상당)는 중국이 공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수입업자들이 상당한 관세 압박하에서도 대체 공급원을 찾을 수 있는 단기적인 유연성은 제한적"이다. 특히 통신, 건설, 제조, 기계, 전기 장비 부문은 중국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미국이 수입하는 PC 모니터와 스마트폰의 70% 이상, 노트북의 66%를 공급했다. 이는 완전한 디커플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쉬톈첸 중국 선임 경제학자는 "강제적 디커플링은 잔인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며, 아마도 미국 정부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히려 공급망의 "연장"이 기준이 될 것이며, 중동 및 동유럽 국가들도 동남아시아나 멕시코처럼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뉴욕증시] FOMC 의사록·물가지표에 '촉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1504005307100be84d8767411822112019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