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이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 밖에 없는 중화학 중심 산업 구조에 발목이 잡혀 석탄과 가스 의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1월 가동을 시작한 강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연간 13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시한 이후까지도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모순으로 꼽혔다.
◇ 독점 구조와 규제 장벽
16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과 소매를 장악하고 발전 자회사들이 대부분의 석탄·가스·원전을 운영하는 독점 구조가 재생에너지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정책 혼선과 재정 부담
가디언은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기조가 뒤바뀌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후임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만에 이를 뒤집었다.
이 같은 혼선 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료비가 폭등하자 2022년에만 22조원의 LNG 발전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고 전기요금을 억제한 결과 한전 부채는 2024년 205조원까지 불어났다.
◇ 기후정책의 허점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는 대기업에 무상 할당이 집중돼 오히려 수천 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신규 석탄 인허가를 금지했고 노후 설비를 폐지하고 있다”며 “탄소포집저장(CCS)과 연료 전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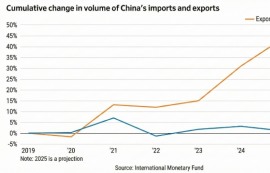

![[실리콘 디코드] 美 정보수장 "中 BGI, 화웨이보다 위험…인류 D...](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20708103801940fbbec65dfb1211312061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