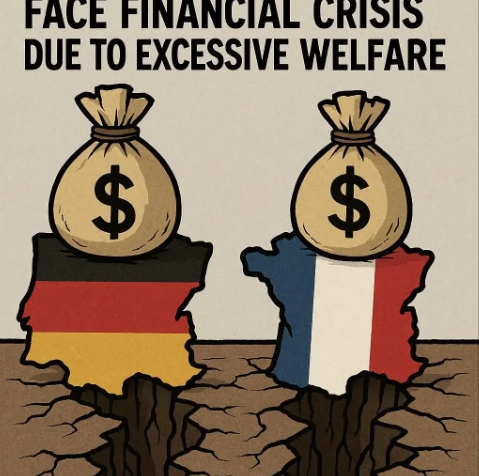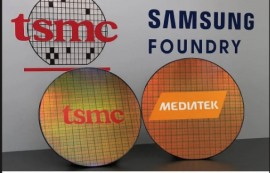佛 72조 원 예산 삭감안 무산·신용등급 하락... 獨 4인 가족 월 820만 원 복지 지급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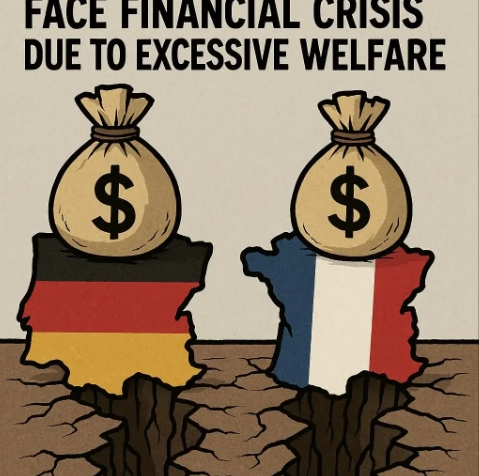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워싱턴포스트는 지난 6일(현지시각) "더 이상 삶의 질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핵심국가 복지 시스템 위기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취임 4주 만인 지난달 전격 사임하면서 프랑스는 15개월간 네 번째 총리 교체라는 초유의 혼란에 빠졌다. 르코르뉘 총리는 440억 유로(약 72조원) 규모 예산 삭감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났다.
15개월간 총리 4명 교체... "절벽 앞 마지막 정거장"
프랑스의 혼란은 재정 문제 때문이다. 앞서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는 연금 동결과 공휴일 2일 폐지를 포함한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내놓았다가 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의회에서 신임투표를 요청했지만, 극우와 극좌 세력이 반대하면서 한 달 만에 불신임당했다. 바이루 총리는 축출 직전 "이것이 절벽 앞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는 2023년 국내총생산(GDP)의 31.5%를 사회보장에 썼다. 프랑스 연구평가통계부에 따르면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동시에 프랑스는 산업화된 나라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지만, 저성장과 고령화로 세수 기반은 계속 줄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깎으면서 "높고 계속 오르는 부채 비율과 분열"을 이유로 꼽았다. 프랑스의 국채 차입 금리는 현재 그리스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반면 수십 년간 경제난을 겪던 이탈리아는 가장 안정된 정부 운영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이 올랐다. 스페인은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며, 실업률도 절반으로 줄었다.
"부자는 도둑" vs "복지 축소 불가"... 세대·계층 간 갈등 심화
재정위기 해법을 두고 프랑스 사회의 갈등은 세대 간, 계층 간으로 번지고 있다. 파리에서 카메라 보조로 일하는 아나스타샤 블레이(31)는 정부의 예술인 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수당으로 산다. 그는 "문제는 불공정, 빈부 격차, 그리고 부자들이 실제로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복지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말했다.
반면 암호화폐 사업가 에릭 라슈베크(52)는 "프랑스식 생각은 성공하거나 부자이거나 기업을 만들면 도둑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대 후반 높은 세금과 규제에 지쳐 프랑스를 떠났던 그는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당선 뒤 귀국했지만, 약속한 세금 인하가 투자나 개혁을 만들어내지 못하자 영구 이민을 고려 중이다.
전직 섬유공장 노동자 크리스틴 부코-포도르스키(75)는 월 1100유로(약 181만 원)의 국가 연금으로 산다. 그는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가 국가 지원을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른다"며 연금 동결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면 연금에 세금을 더 낼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정부는 2023년 헌법 조항을 써서 의회 표결을 건너뛴 채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독일도 위기... "월 5000유로 복지 지원 더는 불가능"
독일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 독일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뒤 제자리걸음 상태다.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은 무너졌지만, 차입비용은 여전히 낮고 대부분 독일인은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8월 회의에서 "우리는 더는 현재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다"며 복지 프로그램 전면 손질을 예고했다. 독일에서는 4인 가족이 기초복지와 주거지원을 합쳐 월 5000유로(약 820만 원), 연간 7만 달러(약 99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지만 연정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베르벨 바스 사민당 공동대표 겸 노동장관은 메르츠 총리의 말에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부 빌렘 아데마 선임경제학자는 "시스템이 덜 관대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에 매우 불만스러워한다"고 진단했다. 파리 소재 자크 들로르 연구소의 안드레아스 아이슬 선임연구원은 "프랑스가 더는 복지국가를 감당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은 주로 선택의 문제"라며 "국가가 얼마나 강한 구실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위협·중국 경쟁·미국 압박... 삼중고 직면
유럽의 복지 위기는 국제 정세 압박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 위협과 동맹국에 관세 압박을 가하는 미국 사이에서 유럽은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전기차와 원자력 발전 같은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유럽과 겨루고 있다.
전 재무장관 미셸 사팽은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뒤 에너지 가격 충격에 너무 많은 재정을 썼다"고 비판하면서도 "지금도 해결책을 찾을 수단이 있으며, 프랑스와 유럽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자원이 있다"고 말했다.
섬유산업이 무너진 루베에서는 옛 제조 시설을 박물관과 창업 공간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기욤 델바르 루베 시장은 "이 도시의 문화는 언제나 스스로를 다시 만들 수 있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옛 모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은 미국식 저복지 시스템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업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현재 복지 시스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