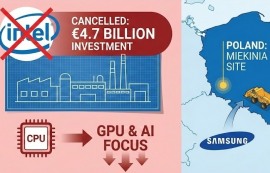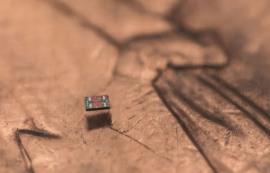'맏형' 합의에도 남은 불씨…부품·타사 노선은 안갯속
생산 정상화 기대와 공급망 리스크가 교차하는 국면
생산 정상화 기대와 공급망 리스크가 교차하는 국면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교섭에서 2025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오는 1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7년 만의 파업 이후 생산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래차 동맹’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년 연장은 현행 계속고용제(정년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되, 앞으로 법 개정 가능성에 대비해 노사 간 지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업계의 긴장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룹 핵심 부품사인 현대모비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이후 10일 4시간, 11일 6시간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사측은 기본급 10만 원, 성과급 400%+1500만 원, 주식 17주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요구안과 격차가 크다고 본다.
모듈과 핵심 부품 공급이 지연될 경우 현대차·기아 라인 전반에 생산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아는 11일 5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정중지가 결정되면 합법적 파업권이 부여되며,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5년간 이어온 무분규 기록이 사라질 수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정년 64세,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잠정합의안이 기아 교섭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지만, 요구사항이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타결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KGM)는 임단협을 조기에 마무리했다. 르노코리아는 7월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었고 8월 말 조인식을 통해 최종 타결했다. KGM 7월 말 합의안이 가결돼 8월 조인식을 열었고, 1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갔다. 이들의 조기 타결은 업계 불확실성을 일부 덜어내는 긍정 요인이다.
현대차의 잠정합의는 국내 최대 완성차 사업장으로서의 불확실성을 낮추면서 업계 전반에 신호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파업, 기아의 쟁의 절차, 한국지엠의 교섭 지연은 리스크로 남아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 환율 변동, 미국발 관세 압박 등의 대외 요인이 겹치면서 협상 여건이 만만치 않다.
현대차 잠정합의가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완성차 업계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 하지만 계열사와 타사 노선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도 크다. 9월 중순 전후 예정된 교섭과 투표 결과가 자동차 산업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차 노사가 협력의 길을 택한 것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라며 "완성차 합의 효과가 계열사까지 확산되지 못하면 생산 차질 우려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