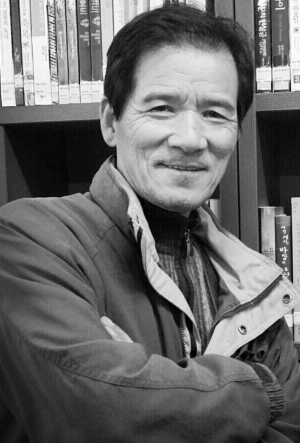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꽃과 잎이 사라져 고스란히 드러난 나무의 수형과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열매들, 저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 수피와 마른 풀들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겨울만의 느낌을 자아낸다. 이를테면 흰 꽃송이가 마른 채로 그대로 달린 나무수국과 붉은 열매와 단풍 든 잎이 멋스러운 남천 위로 눈이 내리면 여느 계절에 못지않게 아름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겨울 산을 찾은 것은 코로나 때문이었다. 부스터 샷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라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모든 기대가 허물어져 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한해의 끝에 서면 허투루 살아온 날들이 후회로 밀려와 우울해지기 쉽다. 그런데 곧 일상으로 돌아가리란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으니 암울하기 그지없는 최악의 연말이 될 것 같다.
“…겨울 산을 오르며 나는 본다 /가장 높은 것들은 추운 곳에서 /얼음처럼 빛나고 /얼어붙은 폭포의 단호한 침묵 /가장 높은 정신은 /추운 곳에서 살아 움직이며 /허옇게 얼어 터진 /계곡과 계곡 사이 /바위와 바위의 /결빙을 노래한다…”(조정권의 ‘산정 묘지’ 부분)
시인의 말처럼 겨울 산을 오르다 보면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 눈 쌓인 겨울 숲은 적막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게 해준다. 산을 오르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우울감도 사라지고 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치유의 숲엔 계절이 없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간밤에 비가 내린 탓인지 숲은 젖어 있다. 눈은 없지만 젖은 낙엽들이 수북이 쌓인 길은 미끄럽다. 조심조심 발을 떼어 놓는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다가는 넘어지기 십상이다. 오직 자신의 발걸음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겨울 산행의 특징이기도 하다. 산을 오를수록 숨은 가빠오는데 머리는 오히려 맑아진다. 희망은 노력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그 노력이 좋은 습관이라면 산을 오르는 것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고 했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목표가 분명해지면 마음속에 희망이 절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하산길에 어느 집 정원에서 ‘사랑의 열매’를 쏙 빼닮은 빨간 열매를 가득 달고 선 백당나무를 보았다. 빨간 열매 세 개로 이루어진 ‘사랑의 열매’는 하나는 나, 다른 하나는 가족,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파란 줄기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한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가난한 연인들이 서로에게 밥을 덜어주듯, 등을 다독여주듯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겨울 산이 봄을 기다리듯 우리의 추운 겨울도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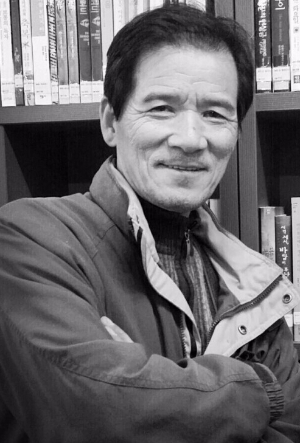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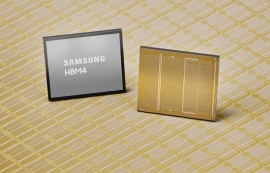








![[르포] 갤럭시 S26 시리즈 실물 공개 첫날..차분한 분위기 속 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16590706624ea14faf6f51232162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