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으로 가는 길에선 많은 꽃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도 민들레는 가장 쉽게, 가장 많이 마주치는 꽃이다. 그 흔한 꽃을 두고 쓴 김상미 시인의 ‘민들레’란 시를 읽다 보면 꽃을 허투루 대하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너에게 꼭 한마디만, 알아듣지 못할 것 뻔히 알면서도, 눈에 어려 노란 꽃, 외로워서 노란 꽃, 너에게 꼭 한마디만, 북한산도 북악산도 인왕산도 아닌, 골목길 처마 밑에 저 혼자 피어 있는 꽃, 다음 날 그다음 날 찾아가 보면, 어느새 제 몸 다 태워 가벼운 흰 재로 날아다니는, 너에게 꼭 한마디만, 나도 그렇게 일생에 꼭 한번 재 같은 사랑을, 문법도 부호도 필요 없는, 세상이 잊은 듯한 사랑을, 태우다 태우다 하얀 재 되어 오래된 첨탑이나 고요한 새 잔등에 내려앉고 싶어, 온몸 슬픔으로 가득 차 지상에 머물기 힘들 때, 그렇게 천의 밤과 천의 낮 말없이 깨우며 피어나 말없이 지는, 예쁜 노란 별, 어느 날 문득 내가 잃어버린 그리움의 꿀맛 같은, 너에게 꼭 한마디만.” -김상미의 ‘민들레’
숲으로 가는 길가에 피어 있는 민들레뿐만 아니라 애기똥풀, 꽃마리, 철쭉, 냉이꽃, 꽃잔디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꽃을 만난다. 때로는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치기도 하면서 숲으로 들어서면 봄이 깊어져 갈 무렵 숲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서늘한 생기가 부드럽게 온몸을 감싸 온다. 철쭉이 지고 난 숲은 한층 농도가 짙어진 초록과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햇빛, 바람에 묻어나는 꽃향기로 그윽하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딱따구리의 나무 쪼아대는 소리가 경쾌하게 숲을 흔들고 간밤 비에 불어난 계곡의 물소리가 주변의 새소리와 더불어 처져 있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저마다 잎을 펼쳐 들고 초록 그늘을 드리운 활엽수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걷는다. 아파트 단지의 쪽동백은 이미 활짝 피었는데 숲속의 쪽동백나무들은 이제야 꽃망울이 부풀기 시작했다. 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자리하느냐에 따라 꽃 피는 시기가 다르다. 단풍나무숲에 이르렀을 때 저만치 허공에 매달린 보랏빛 꽃송이가 보였다. 등꽃이다. 얼마 전 하얗게 꽃을 피워 달고 내 발걸음을 재촉하던 야광나무에 넝쿨을 뻗은 등나무가 포도송이 같은 꽃송이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이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바닥엔 떨어진 꽃송이들이 즐비한데, 등꽃 사이로 꿀을 찾아 날아든 벌들의 날갯짓이 부산하다.
등꽃에 홀려 한참을 등꽃 그늘 밑을 맴돌다가 돌아서는데 애기똥풀 꽃에 앉아 있던 흰나비 한 마리가 오월의 향긋한 대기 속을 팔랑팔랑, 흩날리는 벚꽃처럼 날아간다. 바람을 타고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는 나비의 춤사위는 마법처럼 신비롭기만 하다. 나비의 어원이 ‘날아다니는 빛’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던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허공을 나는 나비의 고요하면서도 경쾌한 날갯짓을 보고 있으면 나비가 되고픈 충동을 느낄 만큼 황홀하다. 나비의 춤사위로 인해 오월의 숲은 생기 넘치는 꽃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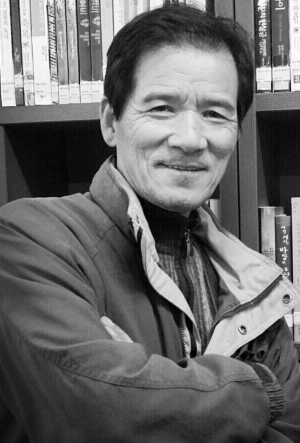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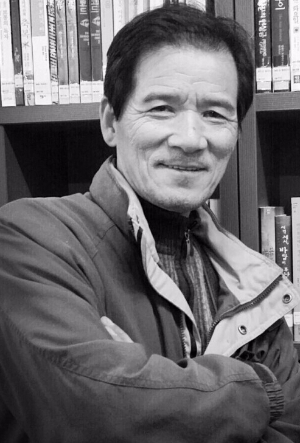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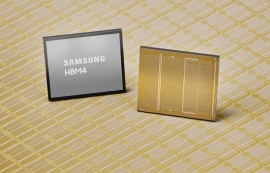








![[르포] 갤럭시 S26 시리즈 실물 공개 첫날..차분한 분위기 속 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16590706624ea14faf6f51232162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