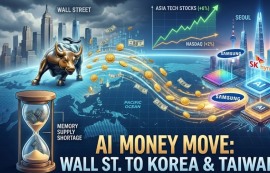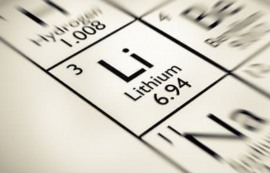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음달 5일(이하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을 두고 첫 공개 변론에 나선다.
중소기업과 주(州) 정부는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했다며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수입 규제 권한을 근거로 맞섰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뿐 아니라 향후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 보도했다.
◇ IEEPA 권한 논란…“과세는 의회 권한” vs “전통적 규제 수단”
러닝리소시스 등 중소기업 7곳과 12개 주 정부는 “IEEPA는 수입을 ‘규제’할 수 있게 했을 뿐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어디에도 과세 용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세금은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요 질문’ 원칙과 ‘위임금지’ 원칙을 근거로 “의회가 수조 달러 규모의 과세 권한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넘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두 원칙은 미국 헌법상 행정부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핵심 법리로 이번 트럼프 관세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요 질문 원칙은 행정부가 막대한 경제적·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명확한 의회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위임금지 원칙은 미 의회가 헌법상 입법권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무제한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관세는 수입 통제의 전통적 수단으로 IEEPA가 명시한 ‘수입 규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 역대급 관세 수입…“평시 최대 증세” 비판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미국의 관세 수입은 2152억 달러(약 305조6000억 원)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4월 174억 달러(약 24조7000억 원), 5월 239억 달러(약 33조9000억 원), 6월 280억 달러(약 39조8000억 원), 7월 290억 달러(약 41조2000억 원)로 증가했고 8·9월 두 달간 합계만 626억 달러(약 88조9000억 원)에 달했다.
원고 측은 정부 스스로도 향후 10년간 3조 달러(약 4260조 원) 규모의 과세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며 “미국 역사상 평시 최대 규모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는 도구”라며 “타국의 오랜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열리는 대법원 변론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공개 심리를 직접 방청할 경우 이는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 법적 쟁점: 비상권한의 한계와 의회의 과세권
이번 사건은 행정부 비상권한의 한계를 둘러싼 법리 충돌로 평가된다.
하급심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으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사태 하 대통령의 수입 통제는 전통적 권한 범주”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관세 부과 범위·기간·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의회로 권한을 환원하도록 판시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반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IEEPA가 사실상 통상 정책의 상시 수단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중소기업 “관세 변동성, 경영 계획 붕괴시켜”
중소 수입업체들은 정부의 관세 정책이 공급망과 재고, 계약 구조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호소한다. 관세는 법적으로 미국 수입업자가 납부하지만 실제로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러닝리소시스 등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수시로 올리고 내리며 위협과 보류를 반복했다”며 “그 결과 수조 달러 규모의 부담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식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절차, 대체 입법 등 후속 혼란이 예상된다.
반대로 합법 판결이 내려지면 관세 수입은 재정의 핵심 재원이 되는 동시에, 교역국의 보복 관세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 5일로 예정된 대법원 변론은 ‘비상권한의 경계’와 ‘의회의 과세권’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