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이런 스토리텔링이 새삼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2020년 세계 식품의 트렌드중 하나는 바로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구성하여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것인가가 하나의 이슈였다. 많은 식품제조 회사들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또 다른 식품의 특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이런 시작은 세계 각국의 무역이 활발히 교류되면서 해당국가 제품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전략들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시작한 지리적 표시제가 이런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왜 사람들은 보통 쌀보다도 경기도 이천 쌀을 더 선호할까? 또는 보성 녹차나 의성 마늘 등을 선택할까?
그런 선택에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선입관이 작용하였고 이 명성의 뒷면에는 스토리텔링이 폭넓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의 특산품들에는 지리적 표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물론 지역 농민들이 그런 소재를 발굴하고 서술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전문적인 기관이나 회사에 의뢰하여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역사적 자료나 문학적 근거 등을 찾아 제출함으로써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최근 한국의 여러 식품에 대하여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각 음식에 얽힌 스토리텔링이 더욱 필요하게 느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식품제조 업자나 단위 조합의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을 펼쳐 주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생각해 보면 이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품격을 올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수행하여 할 사안이라고 여겨진다.
스토리텔링과 같은 영역도 과학적인 연구 못지않게 인문 사회적 관점에서 사료 발굴과 연구가 뒤따라야 하며 한국음식학 분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꾸준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 음식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져 멋지게 꽃피울 수 있다면 이는 멋진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게 되는 일이기도 하다. 인위적으로 한식 세계화를 부르짖기보다는 서서히 피어오르는 새싹처럼 물과 거름을 꾸준히 주어야 하는 일이다.
노봉수 서울여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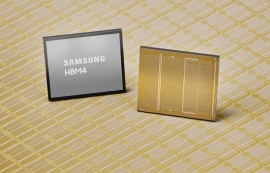








![[르포] 갤럭시 S26 시리즈 실물 공개 첫날..차분한 분위기 속 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16590706624ea14faf6f51232162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