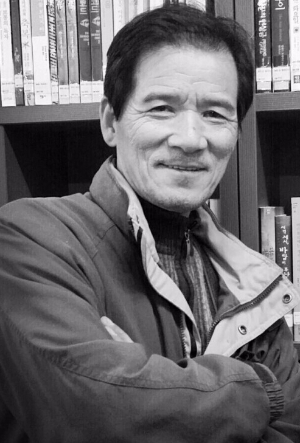
그래서일까. 봄의 어원이 학술적으로는 ‘빛’, ‘볕’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유력하긴 해도 봄꽃을 볼 때면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의미로 ‘봄’이라 했다는 말에 더 마음이 기운다. 봄이 왔다는 말은 꽃이 피었다는 말과 같다. 마찬가지로 꽃을 보는 일은 곧 봄을 만나는 일이기도 하다.
이해인 수녀님의 ‘꽃삽’이란 책에 보면 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서 못 일어날 것 같다가도 잠시 쉬고 나서 다시 움직이면 새 힘을 얻는 것처럼 겨울 뒤에 오는 봄은 깨어남, 일어섬, 움직임의 계절이다. ‘잠에서 깨어나세요.’ ‘일어나 움직이세요.’라고 봄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 소녀처럼 살짝 다가와서 겨울잠 속에 안주하려는 나를 흔들어댄다.”라고.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마스크로 인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춥고 긴 겨울을 보낸 까닭에 유난히 봄을 기다렸던 것 같다. 깨어나고, 일어서고, 움직이는 계절인 봄이 오면 우리들의 답답한 가슴이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월의 끝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것도 실은 남보다 먼저 봄을 만나고픈 조급증 때문이었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겠지만 춘설 속에 매화를 찾던 옛 선비처럼 남보다 먼저 봄을 내 안에 들이고픈 욕심이 무엇보다 컸다. 제주에서 제일 먼저 만난 꽃은 유채꽃이었다. 육지보다 봄이 일찍 시작되는 제주의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유채꽃의 꽃말은 ‘쾌활’이다. 겨우내 추위를 아는지 모르는지, 유채꽃은 철부지 아이처럼 길섶이나 공터에서나 마냥 쾌활하고 명랑하게 노란 꽃망울을 터트린다. 일부러 찾아 나서진 않았는데도 올레길 트레킹 중에 우연히 유채꽃이 만발한 너른 밭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하지만 봄을 만나는 데 반드시 수많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핀 너른 꽃밭이 필요한 건 아니다. 꽃샘바람이 매운 사려니 숲길에서 황금빛 복수초를 처음 보았을 때 유채꽃밭 못지않은 깊은 감흥이 일었다.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니 점점이 피어 있는 노란 복수초가 반짝이는 별처럼 칙칙한 숲에 생생한 봄기운을 불어넣고 있었다. 옛 시인이 낙엽 한 장에서 가을을 느낀다고 했던 것처럼 숲에서 어렵사리 찾아낸 손톱만 한 노루귀 꽃 한 송이에서도 봄을 느끼는 데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처음 꽃을 만나는 게 어려울 뿐 한 번 꽃을 본 뒤엔 눈길 주는 곳마다 신기하게도 어김없이 꽃이 보인다. 봄의 마술이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유채꽃이나 복수초, 노루귀 외에도 참으로 많은 꽃을 보았다. 붉은 동백꽃을 비롯하여 백서향, 괴불주머니, 큰개불알풀, 수선화, 매화, 명자꽃 등 일일이 호명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꽃을 보았다. 그 하나하나의 꽃들이 간직한 봄빛으로 인해 올봄은 충분히 행복할 것도 같다.
지금 마주한 일상이 답답하거나 무료하다면 우선은 문을 열고 꽃을 찾아 나설 일이다. 가만히 앉아 봄을 기다리기보다는 비록 지치고 답답한 일상에서 떨쳐 일어나 봄을 만나시길 권한다. 찬바람 속에서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듯 눈부시게 피어나는 꽃을 보면 응달진 마음 밭에도 희망처럼 환한 봄볕이 들이칠 것이다. 이 세상에 지는 것이 두려워 피지 않는 꽃은 없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