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佛·中·러와 함께 전 세계 원전 용량 70% 장악…바라카 성공으로 체코까지
세계 원전 용량 1위 美 97GW, 佛 63GW 용량으로 2위, 中 55GW 용량으로 3위
세계 원전 용량 1위 美 97GW, 佛 63GW 용량으로 2위, 中 55GW 용량으로 3위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한국, 세계 원전 용량 3분의 2를 차지
올해 6월 기준 IAE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31개국에서 416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총 순 발전 용량은 376기가와트(GW)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위 5개국이 전체 용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97GW 용량의 94개 원자로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1950년대 후반 펜실베이니아의 시핑포트 원자력 발전소로 상업용 원자력을 개척한 미국은 여전히 세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82기가와트시(GWh)를 생산해 국가 전력 공급의 19%, 2023년 전 세계 원자력 생산량의 30%를 담당했다. 미국 원자로들은 지난해 용량 계수가 92%에 이르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효율 수준을 보였다
프랑스는 63GW 용량의 57개 원자로로 2위를 차지했다. 프랑스의 원자력 에너지는 2023년 국가 전력의 거의 65%를 공급했는데, 이는 1970년대 석유 위기에 대응해 1970년에서 1990년 사이 빠른 원자로 건설의 결과다.
중국은 1991년 이후 57개의 원자로가 시운전돼 총 55GW 용량으로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현재 총 30GW 규모의 28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2023년 원자력 생산량은 433GWh를 넘어섰으며, 이는 국가 발전량의 5%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27GW 용량의 36개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를 더 건설하고 있다. 국영 로사톰(Rosatom)은 기존 RBMK 설계를 VVER-1000과 VVER-1200 장치로 바꾸는 한편 원자력 기술의 글로벌 수출 시장을 이끌고 있다.
◇ UAE 4년 만에 원전 비중 23% 기록…세계 최고 성장률
UAE는 원자력 발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다. 더내셔널뉴스 보도에 따르면 UAE는 2020년 8월 바라카 원전 1호기 가동 시작 이후 4년 만에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0%에서 23%까지 끌어올렸다.
엠버(Ember)와 에너지연구소의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2025)' 자료에 따르면, UAE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20년 1.1%에서 시작해 2024년 22.9%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17.8%)과 영국(14.5%)을 넘어선 수치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바라카 원전이 완전히 가동되면 해마다 2240만 톤의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로에서 480만 대의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다.
◇ 한국, 해외수출로 글로벌 원전 공급국 자리 굳혀
한국은 26개의 원자로를 운영하며 26GW 용량으로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원자로당 평균 용량이 1GW로 효율성 높은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영 한국수력원자력은 UAE 바라카 발전소 건설에 이어 체코 두코바니 발전소 확장 계약을 맺는 등 주요 국제 공급업체로 자리잡았다. 한국은 수입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에 따라 현재 2개 원자로를 더 건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한 건설과 운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APR-1400 기술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추가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AP1000 설계를 포함한 외국 기술을 들여와 이를 국내 CAP1000으로 개량하는 등 자체 기술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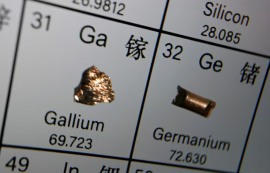
![[뉴욕증시] 이번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촉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2109323203649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