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부른 '반도체 투자 전쟁'…국가 대기금 앞세워 '생산기지'로 부상
R&D 투자 비중은 美의 절반 이하…'기술 자립'은 여전한 과제
R&D 투자 비중은 美의 절반 이하…'기술 자립'은 여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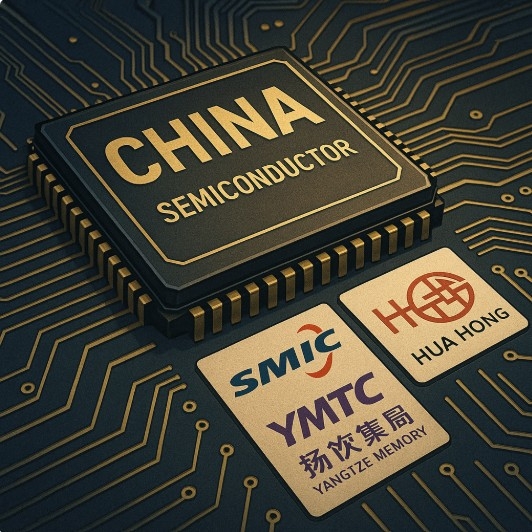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IC WORLD 콘퍼런스 2025'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SEMI 차이나의 릴리 펑 신임 회장은 "AI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빠르게 하는 동시에, 투자와 기술을 둘러싼 세계 경쟁 구도를 새로 짜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정책과 자본을 바탕으로 웨이퍼 제조 역량을 넓히고 장비와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며 주류 공정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AI 혁명은 반도체 시장을 1조 달러 시대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SEMI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19.7% 급증한 6305억 달러(약 889조 원)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는 여기서 11.2% 더 성장해 7000억 달러(약 987조 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AI 인프라 관련 반도체 매출은 2024년 1490억 달러(약 210조 원)에서 2030년 3400억 달러(약 479조 원) 규모로 커져 전체 시장의 3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GPU) 시장은 2025년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에서 2030년 3260억 달러(약 459조 원)로 세 배 이상 성장하며 1조 달러(약 1400조 원) 시장 진입을 이끌 전망이다.
세계는 '반도체 투자 전쟁'…중국, 국가펀드로 맞불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경쟁에 뛰어들었다. 미국은 5000억 달러(약 705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계획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유럽연합은 500억 유로(약 82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유럽 반도체법'을 시행했다. 한국 역시 4500억 달러(약 630조 원) 규모의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TSMC 공장을 유치하는 등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만들었다.
이러한 세계 경쟁 속에서 중국은 2024년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국가 대기금)' 3단계를 출범하며 반도체 자급자족 의지를 분명히 했다. 3단계 펀드의 등록 자본금은 3440억 위안(약 67조9000억 원)으로, 1·2단계를 합친 것보다 크며 운용 기간도 15년으로 늘려 장기 안정 투자의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의 집중 투자는 세계 반도체 생산 지도를 바꾸고 있다. 2000년 일본과 미국이 세계 웨이퍼 생산의 절반 이상을 점유할 때 중국의 비중은 2%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9%, 2020년 17%로 꾸준히 점유율을 높였다. SEMI는 중국의 12인치 웨이퍼 생산 능력 비중이 2026년 26%까지 올라 한국, 대만과 함께 세계 3대 투자 중심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팹 장비 투자액을 기준으로 봐도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2024년 중국은 전 세계 팹 장비 지출의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2025년 투자액은 380억 달러(약 5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22나노(nm)에서 40나노 사이의 주류(레거시) 공정에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이 구간의 생산 능력은 연평균 26.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주류 공정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25%에서 2028년 42%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 팽창 이면의 그림자…첨단 기술은 '아직'
하지만 양적 팽창에도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제는 뚜렷하다. 2025년 예상되는 전 세계 반도체 설비투자 1600억 달러(약 225조 원) 가운데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상위 3개사가 57%를, 상위 5개사가 70% 이상을 차지하며 첨단 기술 투자를 이끌고 있다. 반면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2022년 기준 미국 기업의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18.75%였지만, 중국은 7.6%에 그쳤다.
펑 회장은 "중국이 세계 선두 기업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R&D 지출을 대폭 늘리고 핵심 기술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중국은 중저가 공정에서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추며 세계 공급망 내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으나,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는 미국, 대만,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가 뚜렷해 큰 약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생산 능력의 패권을 넘어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술 자립이 중국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인 셈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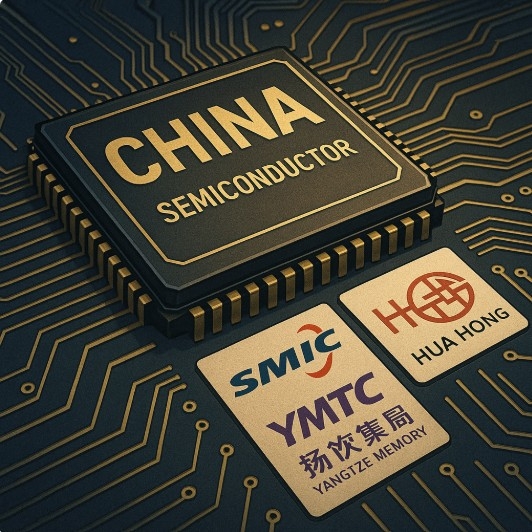






![[초점] KAI "폴란드 FA-50 전투기 2026년부터 순차 인도" 재확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80109300403675fbbec65dfb11612281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