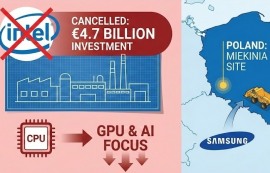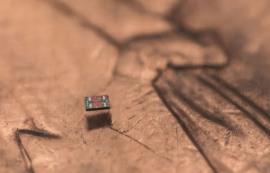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대기업들이 2026년 경영계획을 세우면서도 신규 채용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구인 사이트 인디드는 2026년 고용 증가 폭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와 미국 핀테크 기업 차임은 이미 내년에도 직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달 뉴욕 맨해튼에서 예일대 경영대학원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설문에 응한 경영진의 66%는 내년에 인력을 감축하거나 현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3분의 1에 그쳤다.
인력파견업체 켈리서비스의 크리스 레이든 최고경영자(CEO)는 “기업들은 당분간 관망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사람보다 설비와 기술에 투자하려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의 채용 위축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4.6%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화이트칼라 노동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아마존, 버라이즌, 타깃,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 등 주요 기업들이 최근 수개월간 사무직 인력을 줄이면서 근로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채용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공지능이 더 많은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과도하게 인력을 늘렸던 기업들이 뒤늦게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일대 행사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현재는 사실상 고용 증가가 제로에 가깝다”며 “최고경영자들을 만나보면 모두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대체할 수 있을지 판단할 때까지 채용을 미루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모두가 자기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환경은 근로자들의 이직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비즈니스머신의 아르빈드 크리슈나 CEO는 직원 이탈률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국제비즈니스머신의 자발적 퇴사율은 2% 미만으로 통상적인 7% 수준에서 크게 낮아졌다. 크리슈나 CEO는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다시 채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쇼피파이의 제프 호프마이스터 최고재무책임자도 최근 콘퍼런스에서 “내년에도 직원 수를 늘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인력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웰스파고의 찰리 샤프 CEO는 내년으로 갈수록 직원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웰스파고의 인력은 2019년 약 27만5000명에서 현재 21만명 안팎으로 감소했다. 샤프 CEO는 AI가 인력 구조에 미칠 영향이 “극히 클 것”이라면서도 “많은 경영진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고용 감소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디드의 로라 울리치 경제연구 담당 이사는 내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디드는 2026년 실업률이 올해와 비슷한 4.6%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터 분석과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등 고임금 분야에서 신규 채용이 특히 부진한 반면 의료와 건설 분야의 구인 수요는 상대적으로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울리치 이사는 “경제가 성장한다면 언젠가는 기업들이 다시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저고용·저해고 상태가 성장하는 국내총생산과 오랫동안 공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