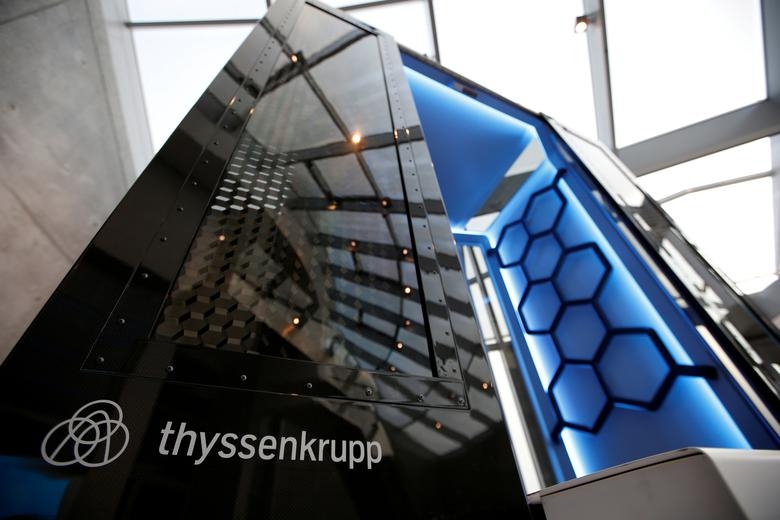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구조역학을 토대로 한 다양한 첨단 건축 기술들이 동원됐겠지만, 건축가들은 두 가지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하나는 강철과 철근 콘크리트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엘리베이터의 탄생이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아무리 높은 층을 쌓더라도 그 건물은 무용지물이다. 도시 생활은 엘리베이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도시 사람들은 자동차보다 엘리베이터를 더 많이 이용한다. 적어도 하루에 10억 명 이상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72시간마다 전 세계 인구를 실어 나른다는 이야기도 있다. 19세기에 등장한 엘리베이터는 누가 봐도 철의 산물이다. 그리고 ‘철강은 제조업의 핵심’이라는 타이틀에 참 잘 어울린다.
#국내 승강기 원조는 도르래와 유사한 거중기를 들 수 있다. 이 거중기는 조선시대 수원 화성을 지을 때 다산 정약용이 발명한 장치이다. 40근의 힘을 가하면 2만5000근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정조대왕의 신임이 두터운 실학자였다. 그는 진주목사였던 아버지 정재원이 별세하자 고향 마현(충북 충주인근)에서 형제들과 3년간의 거상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조대왕은 상중에 있던 다산에게 분부를 내린다.
“수원 화성을 쌓는 규제(規制)를 지어 올리라.”
“궁중에 보관하고 있던 중국책 ‘도서집성’과 ‘기기도설’을 내려 보내니, 무거운 물건을 이끄는 방법과 위로 올리는 방법을 연구하라.”
이런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것이 ‘기중가도설’(起重架圖設)이다. 더하여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제를 적용해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 2년 10개월 뒤인 1796년에 성벽을 완성한다. ‘화성성역의궤’에는 방대한 공사 보고서가 거의 완벽한 형태로 지금도 남아있다.(‘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참고)
#엘리베이터는 고대부터 있었다. 기원은 B.C. 236년경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가 개발한 도르래이다. 이 도르래는 애초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데 사용되다가 점차 사람이나 화물을 수직으로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로 발전했다.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검투사나 동물들을 들여보낼 때에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했다. 동력은 노예나 동물, 수력을 이용하다가,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증기기관을 거쳐 전기로 발전했다.
그러나 증기 엘리베이터는 줄이 끊어지면 추락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이 난제를 해결한 것이 미국 버몬트 출신의 ‘엘리샤 오티스’(1811~1861)이다. ‘오티스’는 1851년 어느 날, 제재소를 침대 프레임 제조공장으로 개조하면서 고민에 빠진다. 무거운 설비를 쉽고 안전하게 공장 3층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오랜 생각 끝에 ‘오티스’는 무릎을 쳤다. 설비를 위로 올리다가 줄이 끊어지면 안전장치가 튀어나와 톱니에 걸리게 하는 엘리베이터를 개발한 것이다.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핵심이었다. 이 장치는 안전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접근한 사고전환의 쾌거였다. 안전을 고민하다 대박을 낸 아이디어 상품들은 많다.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만든 철도 제동장치는 기차가 정지하려면 객차마다 브레이크맨이 달라붙어 기관차에 맞춰 제동을 하는 원시적인 광경을 사라지게 했다. 시속 20~30㎞의 기차가 정지하는 데 1.5㎞의 제동거리는 그가 만든 ‘페일 세이프(Fail safe:이중 안전장치)’ 시스템으로 해결됐다. 1893년 미국 의회는 페일 세이프의 장착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오티스’는 1854년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직접 시연을 했다. 박람회장 한가운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자신이 직접 엘리베이터를 탄 뒤 관람객들 앞에서 줄을 끊어도 엘리베이터가 추락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한 번의 시연으로 ‘오티스’의 엘리베이터는 단박에 유명세를 탔고, 1857년 뉴욕 브로드웨이의 도자기상점인 ‘하우워트’ 5층 건물에 세계 최초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것이 ‘오티스’의 기업역사 첫 머리이다. 1931년 뉴욕 맨해튼에 102층짜리 초대형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도 67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초고층의 엘리베이터는 뉴욕을 인구 1000만이 넘는 초거대 도시로 만들었다.
철강재가 고층 건물을 가능케 했다면, 엘리베이터는 고층건물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펜트하우스의 환상을 준 혁신적인 발명품이다. 세계 초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에는 57개의 엘리베이터가 초속 10m로 운행되고 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타이틀을 보유했던 쿠알라룸푸르 소재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는 복잡하게 설계된 ‘오티스’ 엘리베이터에 의해 기능했다. 그중 다수가 홀수와 짝수 층에 동시에 정차하는 2층 높이의 ‘더블 데커방식' 엘리베이터이다.
#런던 최초의 엘리베이터(1864년)를 갖춘 ‘그로브너’(Grosvenor) 호텔이 등장한 이후로 최고층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 등장했다. 조망이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당연한 현상이었다. 엘리베이터 기술은 점점 발달하여 1880년에는 ‘베르너 존 지멘스’가 개발한 최초의 전기 엘리베이터를 발명하기에 이른다. 기어 박스에 부착된 도르래(Driver Sheave)에 강철 로프를 걸쳐서 구동되는 전기 모터 형식의 엘리베이터는 분당 150m까지 작동시킬 수 있다. 철강기술의 발전이 엘리베이터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심지어 기어가 없는 견인식 엘리베이터가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의 분당 속도는 600m에 달할 정도로 민첩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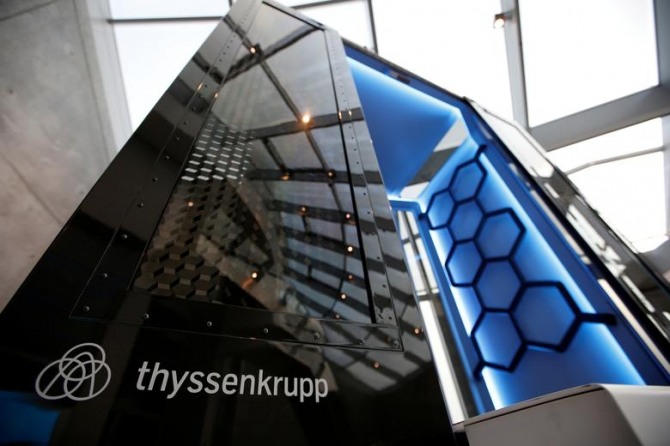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초기의 엘리베이터는 종업원이나 사용자가 수동으로 조종했다. 그러다가 대기 중인 사람들에게 엘리베이터가 보내지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건물이 높아지면서 엘리베이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제 엘리베이터는 컴퓨터 디스패칭 시스템에 의해 최다 운행 유형을 학습하고 운행량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운영을 조절하기에 이른다. 더욱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오직 정해진 구간에서 각 층마다 서는 로컬엘리베이터를 결합시키는 방식이다.
#스카이 로비의 방식도 있다. SOM에서 설계한 100층짜리 건물인 시카고 소재 ‘존 핸콕센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44층에 위치한 이 공중 로비는 상부 주거 층의 편의를 위해 헬스와 레저, 교육시설 등을 제공하였다. 이후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상하이은행에서는 엘리베이터로 도착한 다음 에스컬레이터로 내부 이동을 돕는 2층 높이의 수직마을(Vertical Village) 개념이 적용되었다.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엘리베이터의 익명성을 극복하려는 색다른 시도까지 이루어졌다. 승객 칸을 엘리베이터 수직 통로에서 빼내 유리로 만드는 것이다.
‘베스닌’ 형제(Versnin Brothers)가 1924년 프라우다 타워 계획안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다. 최초의 유리 엘리베이터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아고에 있는 ‘엘 코르테즈 호텔’ 내부에 설치되었다. 건물의 붕괴를 우려한 조치였다. 이후 건물 외벽을 오르내리는 유리 엘리베이터가 나오고 백화점과 같은 건물에 폭넓게 사용되었다. 리처드 로저스가 설계한 런던 ‘로이드 빌딩’의 유리 엘리베이터는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1967년 존 포드만이 설계한 ‘애틀랜타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는 회전식 옥상 레스토랑까지 올라가는 유리 캡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서 유리 엘리베이터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승강기 역사는 이제 100년을 넘었다. 국내 최초의 승강기는 1910년 조선은행(현 화폐금융박물관)에 설치된 화폐 운반용 엘리베이터이다.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1914년 철도호텔(현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처음으로 운행됐다. 1937년에는 화신백화점에 국내 첫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고 1945년에는 서울승강기공업사(현 한국승강기주식회사)란 국내 첫 승강기회사도 설립됐다.
1984년 당시 국내 최고층이었던 63빌딩에는 국내 최초로 분속 540m의 초고속 승강기가 설치되기도 했다. 승강기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계기는 1987년에 발표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었다.
#국내 승강기는 1995년 10만대, 2008년 40만대를 돌파했다. 2014년 2월 25일 고양시 명지병원에는 국내 50만 번째 승강기가 설치됐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승강기는 현재 50~60만 여대를 넘나든다. 인구 100명당 1대꼴이며, 승강기 보유대수로는 세계 8위다. 연간 새 승강기 설치 증가폭은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다. 오래된 아파트의 승강기에서 간혹 벌어지는 안전사고는 공포감을 갖게 한다. 승강기 급증세에 힘입어 승강기 산업도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경남 거창에 승강기대학교와 관련 특화산업단지인 승강기 밸리까지 생겼다. 2014년 4월에는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도 신설됐다.
이처럼 시장성이 넓은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 토종 승강기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세계 유명 엘리베이터 업계가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엘리베이터의 대명사 오티스, 독일의 대표적인 철강기업 티센크루프, 일본 미쓰비시 등 이들 승강기 제조업체들은 2년에 1번씩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에 참가해 해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탑재한 엘리베이터를 선보인다. 엘리베이터의 가장 중요한 장치는 안전이다. 3만여 개 부품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해야 안전할 수 있다. 그만큼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기술개발은 기업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된다.
#현재 세계의 도시화율은 약 50%. 2050년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고 한다. ‘갈수록 도시로 밀려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유럽 최대 철강그룹 독일의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멀티(MULTI)라는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대안으로 내놨다. 로프가 없고, 자기부상 열차처럼 ‘리니어 모터’로 승강기를 움직인다고 한다. 로프의 굴레에서 벗어난 승강기는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건물 내 이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티센크루프는 이런 PR문구를 내놓았었다. “매년 뉴욕시 직장인들이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합치면 무려 16.6년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합치면 5.9년. 이 수치는 도시에서 엘리베이터의 효율성 제고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티센크루프는 좌우로도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높이가 300m 이상인 빌딩에 적용할 것을 권한다. 티센크루프가 2016년 완공된 독일 로트바일의 240m 높이 빌딩에 좌우로 이동 가능한 멀티 시스템을 처음 적용했다.
‘멀티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건축가들에게도 새로운 차원의 건물 디자인에 대한 도전 욕구를 자극한다. 수직으로, 한 통로에 한 대만 움직이는 기존 엘리베이터가 주는 공간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제는 건축가들에게 공간 활용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이다.
#이제 철의 산물 엘리베이터의 진보와 발을 맞출 수 있는 철강신소재 개발이 절실한 순간이다. 중국 부자 안씨가훈(顔氏家訓)을 읽어보면 방향성을 알게 된다.
“재물을 쌓는 것이 천만이라 해도, 몸에 붙은 얇은 기술을 좇음만 같지 못하다.”
안씨 가문은 기술 중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재물은 쌓아두면 없어지지만 몸에 붙은 기술은 잃는 일이 없으므로 그것이 더 낫다는 말이다.
김종대 글로벌이코노믹 철강문화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