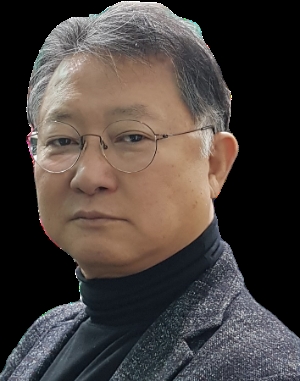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한국 YMCA 태동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이 반상(班常) 차별이 분명하던 시절, 교육·계몽·선교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고관 출신 지식인들이 기독교로 개종, 참여하였다.
1901년 창설 간사로 파송된 질레트는 배재학당을 중심으로 ‘중국·한국·홍콩 YMCA 전체위원회’를 구성, 1902년 세계 YMCA 연맹에 가입해,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가 결성되었다.
황실 지원금으로 마련된 종로 600평 회관은 연설과 강연, 토론회, 운동회, 사경회, 환등회 등 교육과 종교, 사회활동에도 진력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는 연 5만 명을 넘었다.
1945년 광복으로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서울 YMCA) 재건위원회가 소집되어, 재건 운동을 전개했으나, 6·25전쟁으로 서울 YMCA회관 소실과 회장단 납북 등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YMCA는 부산 피난살이에서, 아동 구호, 고아 보육, 상이군인 중환자 보호 활동 등과 농촌사업, 경제자립, 신생활운동 등을 전개했다. 1953년 환도 이후 회관 재건사업에 착수했다.
서울 YMCA회관은 1967년 허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전원의 세비 5% 기부 및 서울시청직원․육해공군본부와 중․고․대학 등 전국적인 성원에 힘입어 회관 낙성식이 있었다.
서울 YMCA는 시민중계실, 청소년 성교육 상담, 향락문화추방·환경보전·의정감시단·부정부패추방·금모으기운동 등 시민운동전개는 정체성 강화와 사회적 신뢰 구축에 성과가 있었다.
YMCA와 YWCA는 ‘70년대 수많은 시국 집회나 단체들이 모여 활동하던 반정부활동의 근거지였으며,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시절, 청년문화와 한류 K-팝의 시작이었다.
서울 YWCA는 1970년대 젊은이들만의 공간이 없던 시절, 직원식당을 개조해 젊은이의 반항과 도약을 지원하는 ‘청개구리’가 통기타, 생맥주, 청바지 등 청년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신입생 환영회 때 부른 ‘아침이슬’은 서정적이고 해학적인 노래로 김민기 선생의 저항 문화가 깃들어 있는 시대적 산물로서, 가수 양희은과 서유석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명동 ‘쎄시봉’ 윤형주·송창식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 조영남 ‘딜라일라’는 번안곡이었다. ‘70년대 청년문화를 대표해, 김민기 작사·작곡 ‘친구’는 필자도 무척 좋아했다.
필자는 10월 유신 시절, 부산 운동권의 대부였던 고 최성묵 목사의 지도로 부산 YMCA 대학-Y 영봉 클럽과 연합회 초대회장에 이어, 청년회 창립 초대 부회장 등 청년기를 보냈다.
서울에 오면, 친구들과 종로 뒷골목의 허름한 주점에서 부침개를 안주로 소주나 막걸리를 마셨다. 이제 가난하고 소박했던 추억들이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말없이 사라지고 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를 나오면 8층짜리 서울YMCA 회관은 지금도 ‘도심 속 박물관’ 같은 존재이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 공평구역 17지구로 지정, 재개발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무조건 과거를 부수면 곤란하다. 서울YMCA 건물은 긴 역사성과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 쌓아 올린 교육·계몽의 철학과 정체성을 살려, 현대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청년문화는 현대사회의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쇠락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권위와 전통만은 인정하고, 조직과 공동체간 대립 관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