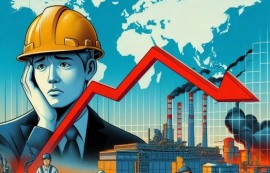美 '칩 통제' 맞서…中, '오픈소스 AI'로 표준 전쟁 선포
화웨이 칩엔 HBM 필요…삼성·SK, 기회이자 '지정학 덫'
화웨이 칩엔 HBM 필요…삼성·SK, 기회이자 '지정학 덫'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미국의 AI 모델은 폐쇄적이고 비싸다. 예산에 민감한 개발도상국들은 결국 저렴하거나 무료인 중국 AI를 선택할 것이고, 이는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던진 이 경고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경쟁을 넘어, 미국 주도의 AI 반도체 패권에 대한 중국의 정교한 '우회 전략'이 본격화됐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수출 통제로 엔비디아 등 최첨단 AI 칩 확보가 어려워진 중국이, '소프트웨어(AI 모델) 개방'을 무기로 AI 생태계의 판을 흔들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각)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슈밋 전 CEO는 팟캐스트에서 미국 AI 모델의 '비용'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는 이미 시장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여러 기업이 비용 효율성을 이유로 미국 솔루션 대신 중국 AI 생태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카이푸 리 01.AI CEO(전 구글 차이나 사장)는 TED AI 콘퍼런스에서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이 이미 메타의 '라마(Llama)'를 능가했다"고 선언했다. 실제 01.AI를 비롯해 바이두, 알리바바 그룹 등이 개발한 중국산 모델들은 글로벌 오픈소스 AI 모델 상위 10위권을 휩쓸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중국이 소프트웨어 전선에서는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했거나 일부 추월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공짜 AI' vs 'CUDA 독점'…표준 전쟁의 서막
중국이 '공짜'와 '고성능'을 앞세운 오픈소스 AI 모델 공세에 나선 이면에는 미국의 고강도 '반도체 전쟁'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AI 시장은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H100, B100 같은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없이는 구동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문제는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단순히 하드웨어 칩 자체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엔비디아의 진정한 '해자(Moat)'는 AI 개발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CUDA)'다. 전 세계 AI 개발자 90% 이상이 CUDA 생태계에 묶여있어, 다른 하드웨어(반도체)로 넘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바로 이 지점을 틀어쥐고 중국의 AI 발전을 옥죄고 있다.
미 상무부는 안보를 이유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을 원천 봉쇄했다. 중국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능이 대폭 낮아진 '다운그레이드' 칩(H20 등)을 쓰거나, 화웨이 '어센드(Ascend) 910B' 같은 자국산 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화웨이 칩은 엔비디아의 몇 세대 전 제품(A100)과 유사한 성능으로 평가받으며, CUDA와 호환되지 않아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 확산 전략은 바로 이 CUDA의 독점적 생태계를 깨기 위한 '묘수'다. 특정 하드웨어(엔비디아 GPU)에 종속되지 않는 강력한 오픈소스 AI 모델을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개발자들이 CUDA가 아닌 다른 플랫폼, 즉 장차 중국이 만들어낼 '자국산 AI 반도체' 위에서도 AI를 구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의도다.
'반도체 자립'과 'AI 일대일로' 투 트랙
알렉스 카프 팰런티어 CEO가 악시오스 행사에서 "미국이 AI 주도권 확보에 실패하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 인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는 AI의 위험성만 따지는 미국 내 담론이 AI의 전략적 지정학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중국의 '하드웨어(반도체 자립)-소프트웨어(생태계 확장)' 투 트랙 전략의 무서움을 직시한 발언이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반도체 자립'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화웨이는 자체 AI 칩 어센드 시리즈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SMIC는 5나노미터(nm) 공정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 아직 수율과 성능 면에서 TSMC나 삼성전자에 한참 뒤처지지만,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격차를 좁히려 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AI 일대일로'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실행 계획'은 백악관의 AI 계획에 대한 맞불이다. 핵심은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협력이다. 이들 국가에 저렴한 AI 모델과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공유를 제안하며 중국 중심의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첫째,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맞서 자국산 AI 칩과 HBM(고대역폭메모리) 개발에 총력전을 펴고 둘째, 동시에 '공짜' 오픈소스 AI 모델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우군'으로 확보해 엔비디아-CUDA로 대표되는 미국 중심의 AI 표준에서 이탈시키는 것이다.
이 거대한 AI 표준 전쟁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HBM'을 생산하는 한국에 거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심각한 위협이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GPU에 탑재되는 HBM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뚫고 유의미한 수준의 자체 AI 칩(화웨이 어센드 등)을 양산하기 시작한다면, 이 칩에도 막대한 양의 HBM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엔비디아 외에 '새로운 HBM 수요처'가 열린다는 의미로, 삼성과 SK하이닉스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봉쇄' 정책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라, 양사 모두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에릭 슈밋의 경고로 수면 위에 드러난 'AI 모델 가격 전쟁'은, 결국 물밑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AI 반도체 표준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 이 패권 다툼의 향방에 따라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지, 혹은 중국이라는 새로운 거대 생태계가 탄생할지 결정될 것이며, 그 중심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서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뉴욕증시] AI株 약세 속 3대 지수 하락 지속](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11906205106679be84d8767411822112019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