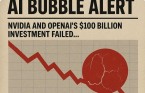높은 금리를 앞세운 저축은행에 높은 한도를 무기로 인뱅이 도전장 던져
![높은 금리의 저축은행과 높은 한도를 앞세운 인뱅의 불꽃 튀는 파킹통장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20725142725015177c99d70e7d3975441.jpg)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들이 수신예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불황에 빠진 주식시장에서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활발해지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시입출금식예금 증가액은 5월 1조7000억원에서 6월 15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수시입출금식금이 급증한 가운데 그간 높은 금리를 앞세워 저축은행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파킹통장 시장에 인뱅이 안정성과 접근성, 그리고 '높은 한도'라는 장점을 앞세워 손님 모시기 경쟁에 뛰어 들었다.
◆ 파킹통장 금리 3% 시대···저축은행 높은 금리 '우위'
OK·웰컴저축은행 등 대형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이 금리 3% 시대를 이끌며 가장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의 OK읏통장(연 3.2%), 웰컴저축은행의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연 3.0%) 등이 최고 3%가 넘는 이자율을 지급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뱅의 파킹통장은 저축은행보다 적은 연 2%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연 2.1%), 토스뱅크의 토스뱅크 통장(연 2.0%),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연 1.2%) 순으로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저축은행에 밀리는 모양새다.
케이뱅크도 지난 15일부터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기존 연 1.3%에서 0.8%p(포인트) 인상한 연 2.1% 수준에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의 경우, 토스뱅크와 마찬가지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쌓이며 매월 넷째주 토요일 쌓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점과 인뱅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내세워 출시 이후 계좌 개설이 10배 이상 폭증 했다.
나아가 카카오뱅크 역시 파킹통장의 금리 인상을 검토중이다.
◆ 인뱅, 높은 '한도' 장점···목돈 굴리기 유리
인뱅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자율 대신 '한도'를 내세워 금융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한도 3억원), 토스뱅크의 토스뱅크 통장(한도 1억원),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한도 1억원)는 OK저축은행의 OK읏통장(한도 1000만원), 웰컴저축은행의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한도 5000만원)에 비해 최소 2배에서 최대 30배가 넘는 한도를 장점으로 내세운다.
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원 한도의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연 3%)을 한도까지 채워 이용시 150만원의 이자수익을 얻게 된다. 반면 케이뱅크의 경우 한도까지 채워 이용시 630만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어 목돈을 굴리기엔 인뱅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스뱅크의 경우 1억원 한도까지 채워 이용시 '지금 이자 받기'를 통해 매일 5400원(세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경우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저축은행으로선 높은 편의성·접근성·안정성을 앞세운 1금융권 인터넷은행들의 공격적 행보가 매우 부담스럽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저축은행으로선 금리 인상을 통한 반격이 유일하다. 향후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관계 강화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한도까지 운영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경우가 드물다. 특히, 서민들의 경우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파킹통장을 더 선호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과 인뱅의 주도권 다툼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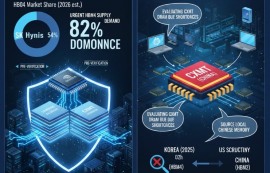

![[뉴욕증시] AI 매도세 지속에 3대 지수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0604570204857be84d8767411822112019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