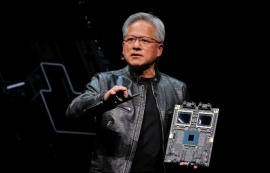OECD "현 추세면 2040년 플라스틱 생산 70% 급증"…기후변화 주범으로도 지목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 고작 6%…전문가들 "근본적 생산 감축이 유일 해법"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 고작 6%…전문가들 "근본적 생산 감축이 유일 해법"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이 플라스틱 생산량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지지했으나, 자국 경제와 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 산유국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생산 감축이라는 근본 해법 대신 재활용, 재사용, 제품 설계 개선이라는 기존의 틀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해법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해마다 4억 톤을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2040년에는 이 수치가 70%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생산된 플라스틱의 상당수는 매립되거나 자연 환경에 그대로 유출된다.
오염 문제뿐만이 아니다. 원료가 거의 모두 화석연료인 플라스틱은 기후 변화의 주범이기도 하다. 유엔(UN)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플라스틱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에 이르는 18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런 가운데 재활용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재활용의 효과는 사실상 미미했다.
OECD에 따르면 생산된 플라스틱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고작 6%에 불과하다. 플라스틱은 종류마다 화학적 구성이 달라 함께 재활용할 수 없고, 이를 분류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비욘드 플라스틱스'의 주디스 엥크 대표는 "플라스틱에는 수많은 색상과 종류(폴리머)가 있고, 제조 과정에서 1만 6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며 "애초에 플라스틱은 쉽게 재활용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른 소재와 견줘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현저히 낮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유리의 재활용률은 31%, 강철 캔은 71%에 이른다. 미국 산림제지협회는 종이와 판지의 재활용률이 각각 64%, 74%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정확한 분리배출을 소비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렵고, 지방 정부 역시 재활용 물질을 처리할 시장이나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면 값비싼 기반시설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재활용 시설 자체가 또 다른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유발하며, 재활용 과정에서 새로운 화학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유출될 우려도 커진다.
또한, 한번 사용된 플라스틱은 강도가 약해져 재활용 과정에서 새로운 플라스틱, 즉 '버진 플라스틱'을 섞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재활용이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을 상대로 플라스틱 재활용의 가능성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 생산 감축 없는 해법은 '한계'…다각적 접근 시급
세계자원연구소의 홀리 코프먼 선임 연구원은 "진정한 목표는 더 많이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 폐기물 자체를 대폭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조약 협상이 무산되면서 전문가들은 근본 해결을 위해 생산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다양한 접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 사용을 넓히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단일 소재를 사용하거나 라벨을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등 재활용이 쉬운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해초 등 지속가능한 대체 소재 연구개발과 상용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생산 감축, 디자인 혁신, 대체 소재 도입과 함께 재활용 기반시설 개선과 소비자 인식 변화를 함께 이뤄낼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