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신청 수수료를 현행 995달러(약 139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3900만 원)로 급격히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이민 규제’ 차원을 넘어 법적 정당성, 글로벌 기업의 인력 전략, 해외 투자까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위헌 논란’
현재 H-1B 비자 제도는 이민법(INA)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규정돼 있다. 현행 체계에서는 등록비 215달러(약 30만 원)와 고용주 신청비 780달러(약 109만 원)를 합쳐 약 995달러(약 139만 원)만 내면 된다.
미국 내 이민 전문 단체들은 조만간 행정명령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들 외신의 전망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도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에서 여러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이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삼권 분립의 원칙’을 둘러싼 헌법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실리콘밸리 기업들 ‘인재 확보 차질’ 우려
H-1B 비자는 매년 8만5000건 발급이 허용되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데이터 과학자 등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핵심 인력 확보에 활용돼 왔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은 매년 수천 건의 H-1B 비자를 통해 해외 인재를 채용해 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MS는 행정명령 서명 직후 사내 이메일을 보내 H-1B 소지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 체류를 권고한다”고 통보했다. JP모건 역시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요청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미국에 머물도록 사실상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
IT 컨설팅 업체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등의 주가는 하루 만에 3~5% 가까이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사실상 신규 채용을 막겠다는 의미”라며 “해외 연구거점 확대나 인재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한국 기업들 “조지아 사태에 이어 또 다른 변수”
한국 기업에도 부담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건설 중인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는 이달 초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신 속에서 이번 비자 수수료 폭탄은 현지 인력 운용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에게 발급된 H-1B 비자는 2506건으로 전체의 약 1% 수준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반도체·배터리·AI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H-1B 비자를 활용해 미국 현지 연구개발을 지원해 온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급격히 불어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주재원 파견은 L-1, E-2 비자를 쓰더라도 현지에서 숙련공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1인당 연간 1억4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국제적 파장 불가피
H-1B 비자의 최대 수혜국인 인도는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승인된 전체 H-1B 비자의 71%가 인도 출신 근로자에게 발급됐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또 다른 긴장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조지아 구금 사태와 비자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외국인 투자, 그리고 미국 법제도의 근본적 갈등이 얽힌 사안”이라며 “법정 다툼과 국제 외교 현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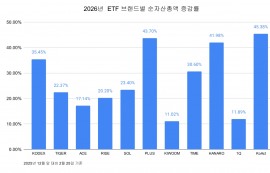






![[르포] 갤럭시 S26 시리즈 실물 공개 첫날..차분한 분위기 속 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16590706624ea14faf6f51232162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