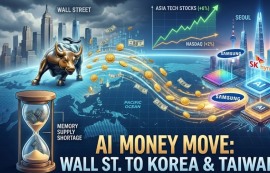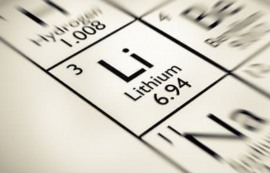한국, 노동자 10명당 로봇 1대 배치…‘자동화 초격차’ 입증
중국, 로봇 밀도 392대로 일본(397대) 턱밑까지 추격 단순 노동 줄고 SW·정비 인력 수요 급증…일자리 지형 재편
중국, 로봇 밀도 392대로 일본(397대) 턱밑까지 추격 단순 노동 줄고 SW·정비 인력 수요 급증…일자리 지형 재편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스페인 매체 ‘러스 스페인(Russ Spain)’은 22일(현지시간) 국제로봇연맹(IFR) 데이터를 인용해 “한국이 2025년 기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1012대를 기록하며 글로벌 자동화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유일한 ‘1000클럽’…싱가포르·독일과 격차 벌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로봇 밀도 1012대는 2위 싱가포르(730대)와 비교해도 280대 이상 많은 수치다. 이는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자 10명당 로봇 1대가 가동 중이라는 뜻으로, 한국이 사실상 ‘인간-로봇 협업’ 단계를 넘어 ‘로봇 중심 제조’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전자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과 자동차 산업의 높은 자동화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수년 전부터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서두른 결과가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유럽 최대 제조 강국인 독일은 415대로 3위를 기록했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과 정밀 기계 공학을 중심으로 꾸준히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밀도 격차는 2배 이상 벌어졌다. 러스 스페인은 “한국은 전자공학과 자동차 산업의 강력한 입지 덕분에 자동화가 이미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평가했다.
‘제조 굴기’ 중국의 약진…일본 제치나
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의 가파른 상승세다. 중국은 로봇 밀도 392대를 기록하며 5위에 올랐다. 이는 4위 일본(397대)과 불과 5대 차이다. 과거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던 중국 제조업이 이제는 첨단 자동화 설비로 빠르게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설비 투자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은 전기차(EV)와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신흥 제조 분야에서 로봇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로봇 산업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일본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맹추격에 쫓기는 형국이다.
이 밖에 스웨덴(343대), 홍콩(333대), 스위스(296대)가 뒤를 이었으며,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강세에 힘입어 292대로 9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85대로 10위에 머물렀다. 미국 정부가 공급망 재편을 위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제조 현장의 자동화 밀도는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봇과 공존’…노동 시장의 이중적 변화
자동화의 확산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보고서는 로봇 도입 확대로 인해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로봇을 유지·보수하고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는 고숙련 기술직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동화는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지만, 동시에 노동자 재교육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한국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도 최근 보고서에서 산업용 로봇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저숙련 노동자의 설 자리를 좁힐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데이터는 한국 제조업이 ‘생산성 혁명’이라는 성과와 ‘일자리 전환’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IFR은 “기술 투자가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로봇 밀도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밀도는 1등이지만…핵심 기술은 일본, 가성비는 중국에 ‘샌드위치’ 우려도
한편 한국이 로봇 활용도(밀도) 측면에서는 세계 정상을 차지했지만, 로봇 산업 생태계의 질적 경쟁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은 ‘부품의 심장’ 쥐고 있는 절대 강자ㅣ다. 로봇 밀도에서는 4위로 밀려났지만, 기술력과 부품 공급망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강이다.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감속기, 서보모터 등 핵심 부품 시장에서 화낙(Fanuc), 야스카와(Yaskawa) 등 일본 기업의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한국이 로봇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일본산 부품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
‘인더스트리 4.0’ 기반의 시스템 통합 강국 독일은 쿠카(KUKA)를 필두로 로봇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를 공장 전체 시스템과 연결하는 ‘시스템 통합(SI)’ 능력에서 독보적이다. 단순히 로봇 대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협동 로봇’ 분야와 스마트 팩토리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 주도’ 국산화와 가격 경쟁력 중국은 정부의 ‘중국제조 2025’ 전략 아래 로봇 부품 국산화율을 무섭게 끌어올리고 있다. 저가형 로봇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최근에는 AI 기술을 접목한 첨단 로봇 분야에서도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기술을 고도화하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이런 경쟁 국가를 상대하려면, 1등, 원천 기술 확보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 대기업의 수요 덕분에 세계 최고의 로봇 활용국이 됐다. 하지만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의 공세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로봇 밀도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말고, 감속기·센서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AI 기반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