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공세와 내수 침체 따른 수출 압박 우려… 포드, 전기차 손실로 82억 달러 순손실 기록
SK온 합작 투자 처분 등 ‘뼈를 깎는 인적 쇄신’ 단행… CATL과 협력하며 ‘실리’ 집중
SK온 합작 투자 처분 등 ‘뼈를 깎는 인적 쇄신’ 단행… CATL과 협력하며 ‘실리’ 집중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저가 생산 방식과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급격한 수요 침체가 결합되어, 전 세계 시장으로 중국산 차량의 수출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포드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지난해 총 81억8000만 달러(약 11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58억7000만 달러 흑자에서 급격히 악화된 수치다.
매출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1872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전기차(EV) 사업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자산 상각, 그리고 한국 SK온과의 배터리 합작 투자 처분 등에 따른 159억 달러의 비상 손실이 실적을 짓눌렀다.
◇ "중국산 저가 공세, 게임의 법칙 바꾸고 있다"
짐 파를리 CEO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기반으로 형성한 ‘가격 결정력’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미국 시장이 현재 중국산 차량에 100% 관세를 부과하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전기화 흐름 속에서 중국 브랜드의 공격적인 확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파를리는 지난 1월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2.1%, 전월 대비 31.9%나 급감한 점을 예의주시했다. 중국 내부에서 팔리지 못한 재고가 결국 전 세계 시장으로 헐값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2025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21.1% 증가한 709만8000대를 수출하며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 포드의 생존 전략: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기회주의적 파트너십’
파를리는 중국 내 합작 투자를 단순히 현지 판매용이 아닌, 저비용 생산을 활용한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드의 중국 수출 부문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포드는 자체 전기차 프로그램을 대거 축소하면서도, 미시간 공장에서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과 협력하여 저렴한 모델용 배터리를 공급받는 파트너십은 유지하고 있다.
포드는 "수익력이 보장되고 경쟁이 적은 핵심 시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 GM 메리 바라 CEO도 한목소리… "과거의 영광은 갔다"
포드의 최대 경쟁사인 제너럴 모터스(GM)의 메리 바라 CEO 역시 비슷한 위기감을 공유했다.
그녀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보조금을 받는 중국 제조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인정하며, 상하이자동차(SAIC)와의 합작 투자를 구조조정하는 등 중국 사업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바라는 중국 시장 내 의미 있는 존재감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5~6년 전만큼의 영향력은 아니다"라며 달라진 위상을 시인했다.
글로벌 자동차 거물들이 잇따라 ‘중국 공포’를 언급하는 가운데, 포드는 32% 지분을 보유한 중국 장링자동차(JMC)의 순이익이 22.7% 감소하는 등 현지 파트너사들의 실적 부진이라는 또 다른 역풍에도 직면해 있다.
2026년은 전통의 강자들이 중국이라는 와일드카드에 맞서 얼마나 빠르게 비용을 최적화하고 파트너십을 재편하느냐에 따라 생존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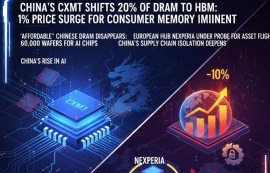



![[뉴욕증시] 기대 이상 고용지표에 3대 지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1202274001439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