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합동대응단 조사 결과, 한 대형 증권사 고위 임원이 2년간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직장 동료와 지인에게 흘렸고, 이들은 친인척 명의 계좌를 이용해 2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문제는 이것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달 추경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소속 임직원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거래한 내역은 최근 5년간 총 77억 원가량에 이른다. 거래 건수는 총 3654건에 달했다. 그런데 형사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3000건이 넘는데 고발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도는 있어도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뜻이다.
문제의 증권사는 이번 사건 이후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임직원을 등록하고, 이상 거래를 자금세탁방지(AML) 기술로 감시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계좌까지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강력하게 징계한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은 대부분 고객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임직원의 가족 계좌나 타사 계좌까지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다. 가족 계좌까지 보려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생기고, 안 하자니 통제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사고가 터지기 전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 "재발 방지하겠다", "엄정 대응하겠다"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 시장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원한다. 위반 사례가 나오면 즉각 형사 고발하고, 증권사가 제대로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교훈은 명확하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시스템과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한두 증권사가 앞서 나간다 해도 업계 전체가 따라오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금융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미공개 정보 유출과 차명계좌 활용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다. 정보를 흘리는 순간, 개인의 커리어뿐 아니라 시장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묻는다. 언제까지 '권고'만 할 것인가.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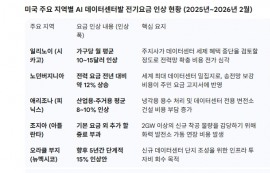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으로 혼조세 마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2703563309056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