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대-앨라배마대 연구팀, 공액 고분자로 양자 스핀 제어 성공
실온서 44마이크로초 스핀-격자 완화 시간 달성...기존 분자 시스템 압도
마이크로파 펄스로 라비 진동 구현해 양자 게이트 연산 가능성 확인
유연 폴리머 소재 활용해 박막 트랜지스터 제작…전자-양자 기술 융합 기대
실온서 44마이크로초 스핀-격자 완화 시간 달성...기존 분자 시스템 압도
마이크로파 펄스로 라비 진동 구현해 양자 게이트 연산 가능성 확인
유연 폴리머 소재 활용해 박막 트랜지스터 제작…전자-양자 기술 융합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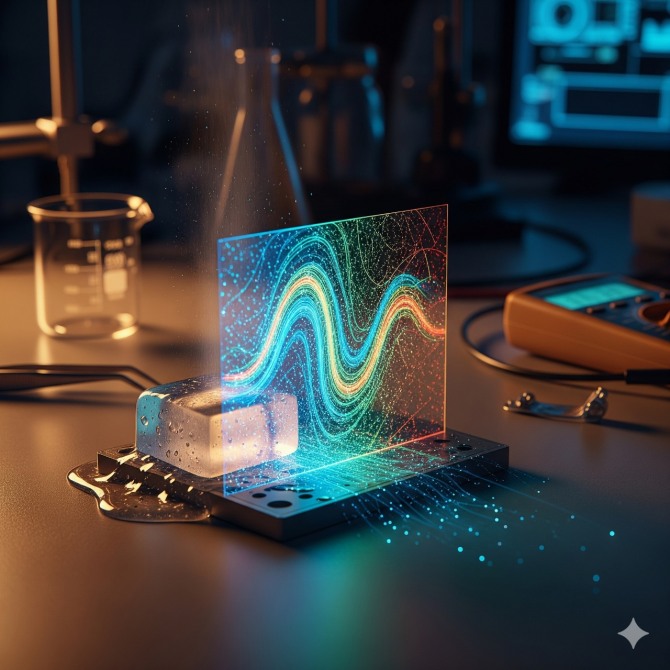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양자 상태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에서만 유지되었기 때문에, 양자 장치는 차가운 거대한 냉장고 안에 보관해야 했다. 이 때문에 양자 컴퓨팅, 양자 센서 등은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
20일(현지시각) 과학 기술 전문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와 앨라배마 대학교 연구팀이 상온에서도 양자 상태를 유지하고 조작할 수 있는 플라스틱 형태의 새로운 '폴리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이아몬드 대신 '화학'에서 답을 찾았다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연구팀은 단단한 결정 대신 화학적 접근 방식을 택했다. 그들은 전자를 전도하는 긴 분자 사슬인 '공액 고분자'를 설계했다. 특히, 이 폴리머는 디티에노실롤(Dithienosilole)이라는 유기 화합물과 티아디아졸로퀴녹살린(thiadiazoloquinoxaline)이라는 두 구성 요소를 결합했다.
연구팀은 두 구성 요소가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 스핀(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자역학적 성질)이 양자 정보를 잃지 않고 폴리머 사슬을 따라 이동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사슬이 너무 밀집하게 쌓여 양자 상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너 유닛의 중심부에 실리콘 원자를 배치해 사슬이 약간 꼬이도록 했다. 이 '꼬임' 덕분에 양자 상태를 파괴하는 유해한 상호 작용을 줄일 수 있었다.
실온에서 양자 상태 안정적으로 유지
연구팀은 개발한 폴리머의 성능을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전자상자성공명(EPR) 분광법 실험 결과, 이 폴리머의 전자 스핀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주변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은 마이크로파 펄스를 이용해 스핀 상태를 예측 가능하게 반전시키는 '라비 진동'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양자 컴퓨팅에 필요한 기본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 기술 상용화의 중요한 발걸음
이번 연구는 양자 물질이 극저온 챔버에 갇힌 깨지기 쉬운 결정체일 필요가 없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고체 상태에서 일관된 제어가 가능한 실용적 유기 고스핀 큐비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이 폴리머는 유연하고 가공성이 뛰어나 박막 트랜지스터로 제작될 수 있어, 기존 전자 기술과 양자 기술을 결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일상 환경에서 작동하는 실용적인 양자 센서나 양자 컴퓨팅 플랫폼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수준까지 위상 기억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팀은 앞으로 폴리머 구조를 최적화하고 다양한 장치 아키텍처를 탐색하며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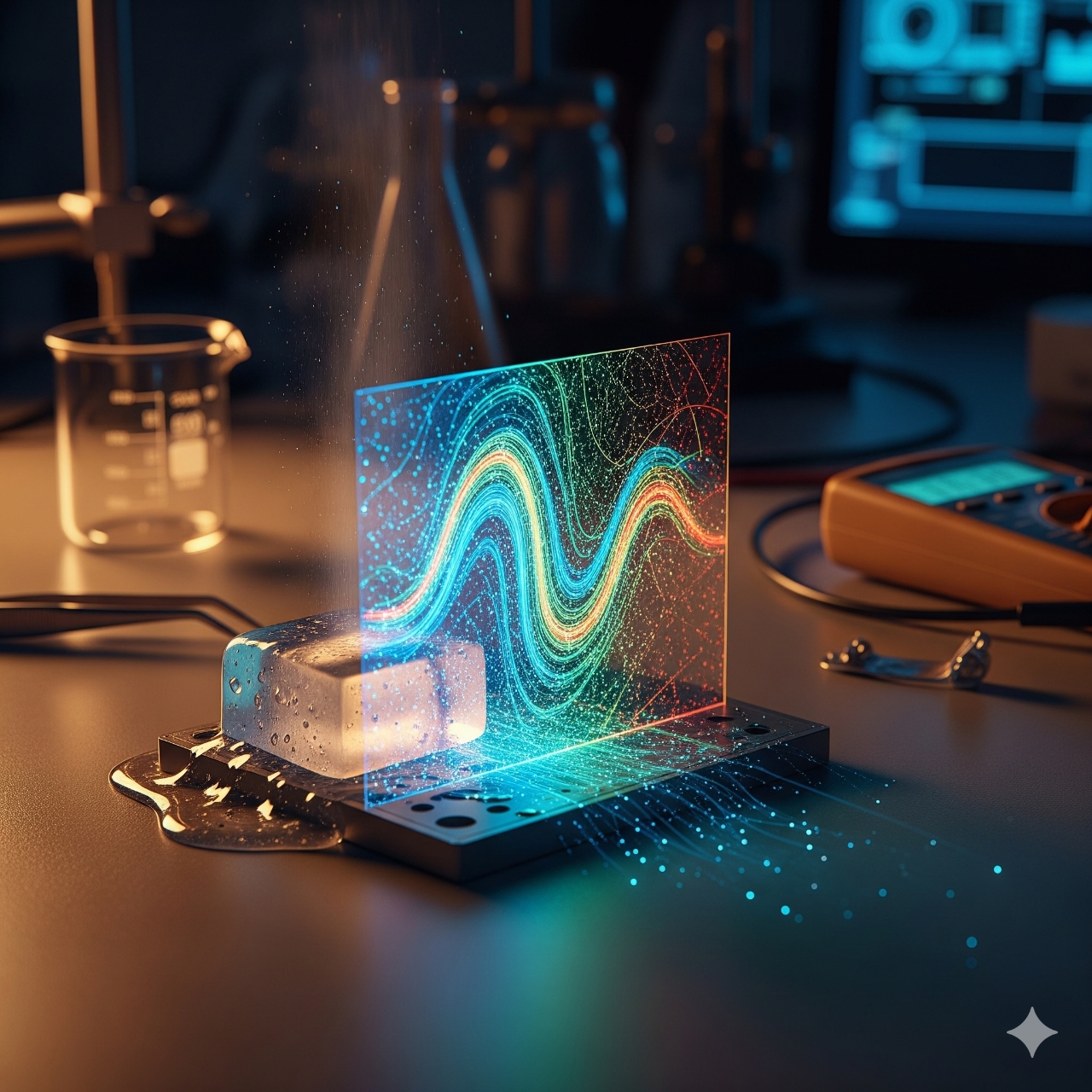

![[뉴욕증시] 금리인하 기대감에 3대 지수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12206252503325be84d87674118221120199.jpg)




![[실리콘 디코드] "美 보조금 받으면 中 장비 10년 퇴출"…삼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12208145206641fbbec65dfb2101781272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