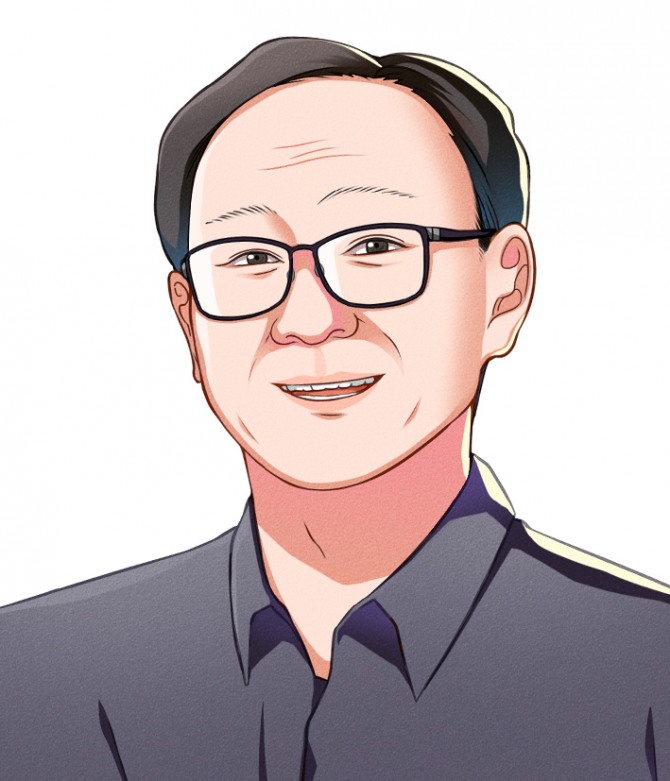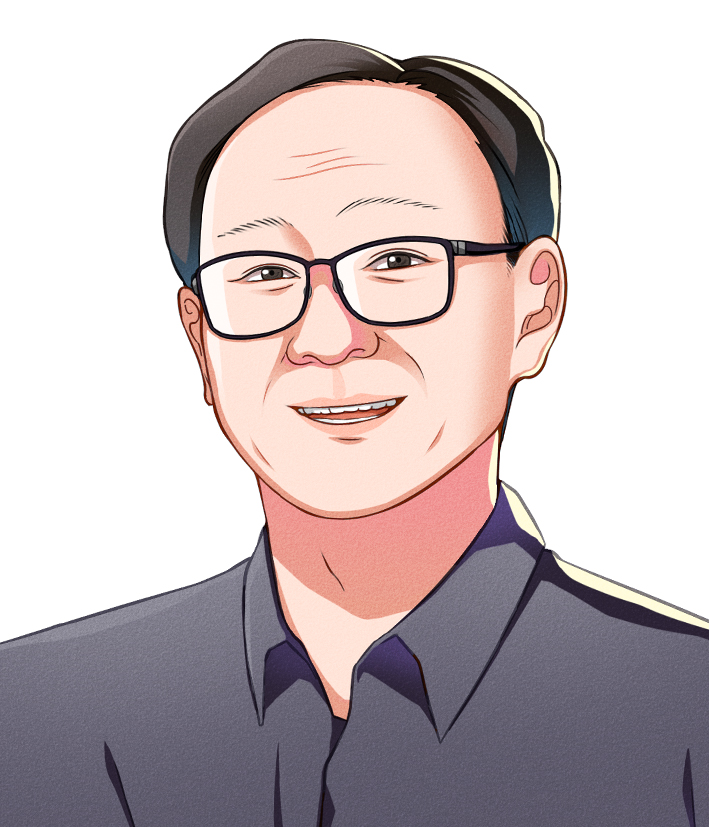몹시 초조함을 나타날 때 “왜, 안절부절이야?”라고 하는데, ‘안절부절이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몹시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안절부절못하다’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안절부절하다’나 ‘안절부절이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안절부절하다’와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이다’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만, 표준어를 새로 제정하면서 가장 널리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안절부절못하다’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표준어규정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가족들은 안절부절못하며 수술 결과를 기다렸다.” 혹은 “안절부절못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앉아있거라.”처럼 쓰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주견이나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다는 말은 ‘주책이다’와 ‘주책없다’ 가운데 어떤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책없다’가 맞습니다.
‘주책’은 상반된 두 가지 뜻이 있어 더욱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뜻으로,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주책이 없어져 다른 사람의 말에 자주 귀를 기울이게 된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책이 없다’고 하면 일정한 주장이 없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지만, ‘주책이다’라고 하면 ‘주책이 있다’의 뜻과 비슷하게 되어 우리가 흔히 쓰는 실없는 사람의 의미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표준어규정 제25항에서는 ‘주책없다’가 표준어이고 ‘주책이다’는 표준어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줏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다’를 ‘주책이다’로 알고 “그 양반 왜 그렇게 주책이니?”처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주책’의 두 번째 뜻은 첫 번째 뜻과는 정반대인 부정적인 뜻으로, ‘일정한 줏대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일정한 주장이 없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주책이다’로 써도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표준어규정 제25항에서는 ‘주책없다’ ‘주책을 떨다’만 표준어로 규정하고 ‘주책이다’는 과감히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