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제 ‘통신기업’이라 부르기 어색해질 정도로 통신 이외에 많은 것을 한다. 특히 SK텔레콤은 OTT와 모빌리티, 앱 마켓, e커머스 등 ‘비(非)통신’ 영역을 따로 떼어내 독립된 회사를 세우기도 했다.
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SK텔레콤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관련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구독 플랫폼 T우주를 활용한 다채로운 구독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는 최근 ‘KT’의 ‘T’는 텔레콤(Telecom)이 아닌 테크(Tech)라고 선언했다. 기업용 솔루션과 클라우드, AI, 로봇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는 분명 칭찬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들이 기존의 통신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10년간 통신3사가 낸 크고 작은 통신장애와 사고는 약 20건에 이른다. 주로 통신사 장비 문제가 가장 많았다. 가장 기본적인 통신장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통신사들은 신사업에 투자할수록 기존 통신업무도 더욱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데 눈 돌린다”라고 욕먹을 수 있다. 이건 꽤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다.
소비자는 기업의 자존심을 걱정해주지 않는다. 자신들의 자존심 다 버려가며 어렵게 번 돈으로 낸 통신비가 엉망진창의 서비스로 돌아오면 그보다 기분 나쁘고 화나는 일은 없다. 신사업에 집중하는 통신사들은 기존 통신사업도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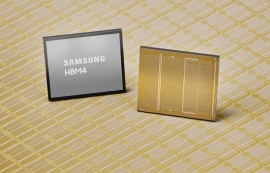








![[르포] 갤럭시 S26 시리즈 실물 공개 첫날..차분한 분위기 속 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16590706624ea14faf6f51232162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