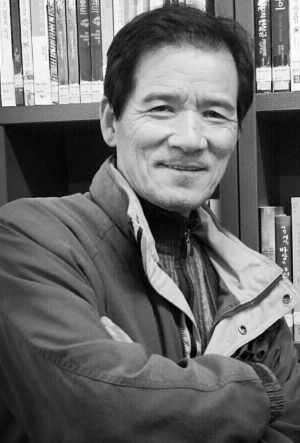
서울의 진산으로 청량한 물과 맑은 공기를 공급해주고, 계절마다 다양한 풍경을 연출하며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북한산을 오르는 길은 무수히 많다. 걷는 길마다 색다른 풍경을 펼쳐 보이는데 그중에도 ‘숨은벽 코스’는 백운대를 오르는 수많은 등산코스 중에 난도가 높은 색다른 풍경과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른 아침, 구파발역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북한산성 입구를 지나 효자 2동에서 내려 ‘밤골공원 지킴터'에서 산행을 시작했다. 아직 단풍을 보기엔 이르지만 쾌청한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빛 햇살과 나뭇잎을 찰랑이게 하는 산들바람만으로도 발걸음이 사뿐하다. 백운대까지는 4.3㎞. 오솔길이라기엔 자주 나무계단이 설치되어 1.5㎞ 지점의 안전쉼터에서 가빠진 숨을 고른 후 다시 경사가 가팔라진 계단과 쇠 난간이 설치된 암릉 구간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금세 숨도 차고 등어리가 땀에 젖는데 높이 오를수록 탁 트이는 전망 덕분에 그동안 땀 흘린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다.
해골바위를 지나 어렵사리 마당바위에 오르니 낯설지만 웅장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예전의 북한산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수봉과 백운대 사이에 숨겨진 숨은벽이 위용을 자랑하며 시선을 압도한다. 북한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우람하고도 장엄한 암벽풍경이다. 정오를 지나지 않은 이른 시간이라서 쏟아지는 햇살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없어 더 신비롭고 아련하여 ‘숨은벽’이란 이름이 제법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 비하면 저 멀리 상장능선 너머로 솟은 도봉산의 오봉과 신선대, 자운봉, 만장봉, 선인봉은 오히려 또렷하여 정겹게 느껴진다.
백운대에 오르기 위해선 숨은벽의 절벽 위 암릉을 지나야 한다. 오른쪽의 절벽을 의식하며 조심조심 걸음을 옮긴다. 숨은벽 앞에서 쇠 난간이 박힌 급경사의 절벽을 타고 내려와 너덜경의 협곡을 다시 오른다. 고개를 젖혀 수직의 절벽을 바라보는데 붉게 물든 단풍나무 한 그루가 가을! 이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그러고 보니 길섶에 피어 있던 흰 구절초와, 절벽을 내려설 때 암벽에 매달리듯 피어 있던 보랏빛 산부추, 붉게 빛나던 팥배나무 열매들도 보았는데 긴장하여 그냥 지나쳤다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온다.
백운대를 올랐다가 우이동 쪽으로 내려오며 인수봉을 오르는 수많은 클라이머들을 보았다. 숨은벽을 오르며 그동안 우이동 쪽에서 바라보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북한산의 모습을 보았듯이 바위 절벽을 타고 오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마음 풍경이 문득 궁금해진다. 궁금하면 직접 올라야만 한다. 등산은 셀프(self)니까.
백승훈 시인

















































![[초점] 머스크, 슈퍼차저팀 전원 해고 전 정부 보조금 244억 챙겨](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50210093208588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