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제동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때가 너무 일찍 찾아온 느낌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했는데, 특히 올해 성장세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지금까지 대략 연평균 5만 대 수준으로 판매됐다고 치면(참고로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9만7077대, 올해 8월까지 판매량은 10만1508대로 4.6% 증가에 그쳤다) 적어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지난달 25일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차 구매 국비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차량 기본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차(승용)를 산다면 제조사가 제공하는 할인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제조사가 500만원 이상을 할인하면 나라에서 100만원을 얹어준다는 뜻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EV세일페스타를 열고 최대 400만원 할인가를 붙였다. 아이오닉5를 사면 480만원의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다.
혹하는 제안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맞는 걸까 아리송하다. 본인이 전기차를 아직 사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전기차 가격이 싸지고 있는 것은 안다. 물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단지 불편함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은 애초부터 나왔던 문제다. 이런 불편함을 안고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정부 보조금의 원래 취지다. 결국 전기차 판매 속도만큼, 혹은 보조금이 줄어드는 속도만큼 충전 인프라는 더 빠르게 확대돼야 한다는 말이다. 대부분이 이 점에서 전기차가 시기상조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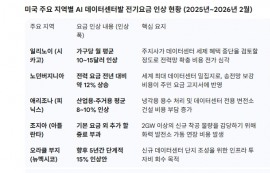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으로 혼조세 마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2703563309056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