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석양 무렵 모래톱에 외다리로 서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요히 서 있는 왜가리의 모습은 수도자의 모습에 비견될 만도 하다. 하지만 우아한 목을 길게 빼고 물속을 응시하다가 어느 한순간 쏜살같이 머리를 물속에 처박아 먹이를 잡는 걸 보면서 새든 사람이든 먹고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늘 만만치 않음을 깨닫기도 한다. 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바람을 타는 억새와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며 반겨주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냇물은 가을빛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산책하는 이의 발걸음을 저절로 느려지게 만든다.
봄, 여름을 지나며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나무들을 살펴보면 제법 튼실해진 열매들이 눈에 들어온다. 감나무나 밤나무·사과나무 같은 과실수 외에도 산딸나무와 마가목·산사나무·작살나무·남천·찔레 열매까지… 아직은 푸른 열매지만 가을 햇살은 곧 열매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고 달콤한 가을 향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길섶에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여뀌꽃 무리를 보면 황금물결이 일렁이는 고향의 가을 들녘이 절로 떠오른다. 삽 한 자루 들고 물꼬 보러 가던 길에 소슬하게 피어있던 꽃이 여뀌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초가을로 접어들며 피어있는 꽃들의 종류가 줄긴 했지만 꽃은 여전히 피어 우리의 눈길을 잡아끈다. 요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눈에 띄는 꽃 중에 닥풀꽃이 있다. 닥풀은 아욱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황촉규(黃蜀葵)라고도 부른다. 원산지가 중국인 닥풀은 원래는 열대지방 식물이지만 오래전에 도입되어 재배된 귀화식물로 아주 낯선 꽃은 아니다. 아침 산책을 나섰다가 어느 밭머리에서 무리 지어 피어있는 닥풀꽃을 만났다. 여느 야생화에 비하면 꽃이 매우 큰 편이다. 언뜻 보기엔 접시꽃이나 부용꽃과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데 모두 과와 속이 같아 생김새나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닥풀의 식물명은 한지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종이인 한지는 닥나무 껍질을 벗겨서 제조했는데 종이를 채로 뜰 때 닥나무 분말이 서로 잘 붙게 하는 데 닥풀 뿌리에서 얻은 진액을 접착제로 썼다. 닥풀의 뿌리를 물에 담가두면 끈끈한 진액이 나와서 풀처럼 되는데 닥나무 분말을 닥풀 뿌리 진액에 분산시켜 종이 제조에 사용하면서 닥풀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닥풀의 어린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고 닥풀의 꽃, 종자, 뿌리를 ‘황촉규화’, ‘황촉규자’, ‘황촉규근’으로 부르며 약용했다.
한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에 다다르도록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가. 생각하면 후회할 일도 많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다. 꽃이 피는 순간만이 절정이 아니라 새잎이 피는 순간도, 열매가 익어가는 순간도 삶의 한 부분이며 역사의 한 페이지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버릴 것 없이 몽땅 아름다운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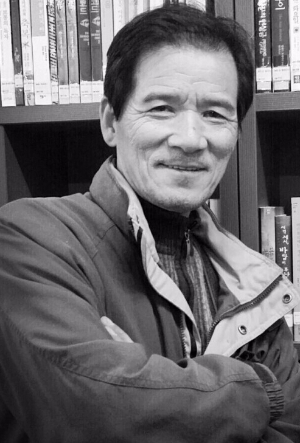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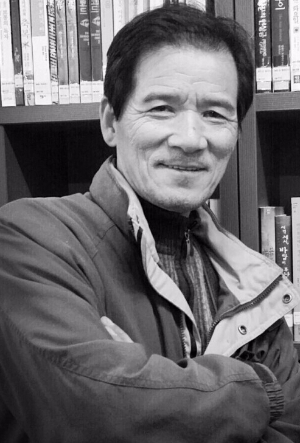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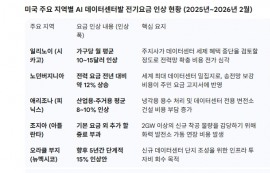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으로 혼조세 마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2703563309056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