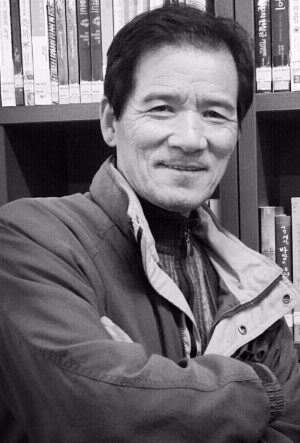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2009년 5월 8일 옛 가야의 땅이었던 경남 함안군 성산산성 발굴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 중 연꽃씨앗이 발견되었다. 3알을 수습한 것을 시작으로 몇 개의 연꽃씨앗을 더 수습하여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니 무려 700년 전, 고려시대의 씨앗으로 확인되었다. 과연 싹이 틀 수 있을까?
함안군은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발아를 시도한 결과 8개의 씨앗 중 3 개의 씨앗을 발아시켜 2010년 7월 아름답고 탐스런 연꽃을 피우는 데 성공하였다. 사람들은 옛 아라가야의 땅에서 태어난 붉은 연꽃이라 해서 ‘아라홍련’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무려 700년의 시간을 거슬러 피어난 이 연꽃은 고려 시대 탱화에서 보이는 연꽃의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꽃을 피운 세 그루의 아라홍련은 서너 해 만에 무더기로 불어나 이젠 여름이면 함안박물관 연못을 등불처럼 환하게 밝히는 연꽃단지를 이루어 함안군의 자랑이 되었다. 이보다 오랜 기록으로는 1953년 일본에서는 신석기 시대인 2000여 년 전 연꽃 씨앗 3개가 당시 카누에서 발굴됐는데, 이 씨앗 역시 3개 중 2개가 보란 듯이 싹을 틔운 적이 있다.
이처럼 많은 식물들의 씨앗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씨앗이야말로 자신들의 미래인 까닭이다. 나와 같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탐하는 사람들은 씨앗에 별 관심이 없지만 씨앗은 식물이 3억여년 전 만든 혁신적 번식 전략의 산물이자 어디서든 살아 남을 수 있는 생존배낭이다. 이처럼 식물들은 씨앗 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온갖 방법과 장치들을 정성으로 마련해 두었기 떄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꽃이 식물의 절정기라고 생각하지만 꽃은 보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열매(씨앗)야말로 성실하게 살아온 식물들만이 받을 수 있는 생애 가장 빛나는 훈장인 셈이다.
식물들의 씨앗이 휴면기를 갖는 것은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로 건너가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휴면기에 들어간 씨앗들은 온도나 빛, 수분 등 외부의 환경 조건이 발아에 알맞게 충족될 때까지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딘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아라홍련처럼 수백수천 년의 기간도 너끈히 참아낸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싹 틔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기회를 끊임없이 탐색한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참고 견디어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싹을 틔운다. 적절한 때가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휴면능력 덕분에 식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견디고 우리 앞에 화사하게 피어난 아라연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생의 신비요, 자연의 경이로움이 아닐 수 없다. 급격한 과학의 발달로 속도에 민감해진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기다림에 인색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빠름! 빠름! 빠름! 하는 통신사 광고처럼 속도에 목숨을 건다. 하지만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멈추지 않는 인디언처럼 화려한 꽃의 시간을 꿈꾸며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 아라홍련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지혜를 일깨운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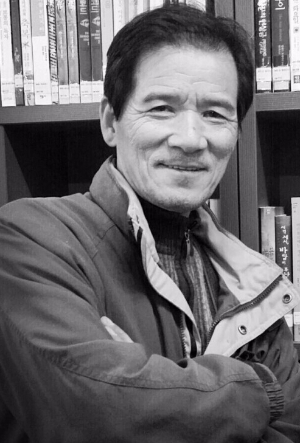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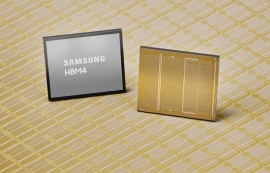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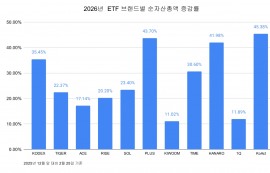






![[르포] 갤럭시 S26 시리즈 실물 공개 첫날..차분한 분위기 속 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16590706624ea14faf6f5123216236.jpg)













